[사설] 금융 경쟁력 강화, 그림은 또 근사한데…
제조업은 일류인데 금융은 삼류라는 비판이 나온 지 오래다. 노무현·이명박 정부가 금융허브, 금융중심지를 내걸었지만 지난 10년간 발전은커녕 오히려 퇴보로 일관한 금융이다. 은행은 예대마진에 목을 매고, 증권은 위탁수수료가 수익의 절반인 행태도 변한 게 없다. 게다가 툭하면 금융사고가 터질 만큼 허술하고, 해외에 나갔다 하면 비싼 수업료만 치르기 일쑤다. 뜬구름 잡는 구호를 외치는 동안 한국 금융은 기본기도 못 갖추고 안방에서 이전투구를 벌여왔다.
그런 점에서 금융위의 고민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금융 경쟁력은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다. 근사한 구호나 국제금융센터 신축으로 금융허브가 되는 게 아니듯이, 정부가 장밋빛 비전을 내놓는다고 금융이 선진화될 리 없다. 역대 정권마다 네거티브 규제완화를 외치지 않은 경우도 없었다. 그러나 관료들은 규제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고, 혹여 문제가 생기면 곧장 더 큰 규제로 회귀해왔을 뿐이다. 금융이 붕어빵이고 우물안 개구리가 된 이유다.
설상가상으로 정치권은 서슬 퍼런 금산분리로 은행은 물론 보험 증권 등 2금융권까지 주인 없는 금융회사로 만들려는 판국이다. 이런 환경에서 무슨 혁신이 일어나겠는가. 금융 경쟁력은 곧 사람에 달렸다. 민간의 창의가 발휘돼 그곳에 돈이 몰리고, 그 결과 더 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져야 결과적으로 생기는 게 경쟁력이다. K팝과 한류드라마도 정부가 잘해서 성공한 게 아니다. 불법·불공정행위만 아니라면 차라리 금융을 내버려 둬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한경에세이] 꼬인 문제를 푸는 전략 노하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36609646.3.jpg)

![[토요칼럼] 염증 같은 나라!…플라톤의 저주 피하려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14342445.3.jpg)


![엔비디아 이을 "숨은 AI 수혜주"…월가 47% 더 오를 것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2507272374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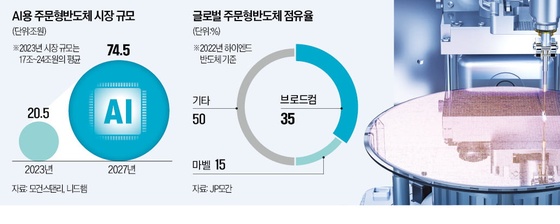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