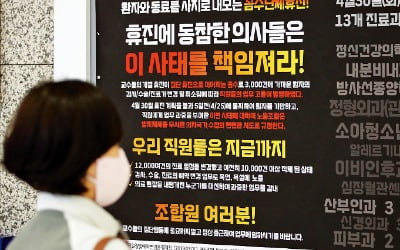'오원춘 사건' 그곳서 또 성폭행…경찰, 문 밖에서 1시간 '허송'
강제 진입지침 '있으나마나'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출장 스포츠마사지 업체에서 일하는 30대 여성 A씨(36)를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임모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3일 오전 3시20분께 수원시 지동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방에서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현금 2만9000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파출소 소속 경찰 2명은 A씨의 휴대폰이 꺼져 있는 점을 수상히 여긴 A씨 직장 동료의 신고를 받고 같은 날 오전 3시35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그러나 임씨의 집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건물 외벽 창문을 통해 방 안 상황을 지켜보다 A씨가 임씨 집을 나선 오전 4시30분께 임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집에 있던 두 남녀의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워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지만 임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 전과자라는 게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임씨는 2007년 성폭행으로 징역 2년6월, 2010년 강간미수로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받고 올 2월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착용해왔다.
전자발찌는 착용자가 거주지에서 반경 2㎞ 이상 벗어나면 법무부를 통해 관할 경찰서가 파악할 수 있을 뿐 이번처럼 자신의 집이나 집 근처를 범행 장소로 고르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이 경찰을 곤혹스럽게 만든 것은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면서도 관할 지역 내 전자발찌 착용자의 거주지인지 파악하지 못한 점, 범행 장소가 오원춘 사건 발생 지점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이었다는 점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사람의 생명·신체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경찰이 강제 진압토록 하는 지침을 전국 일선 경찰서에 내린 바 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