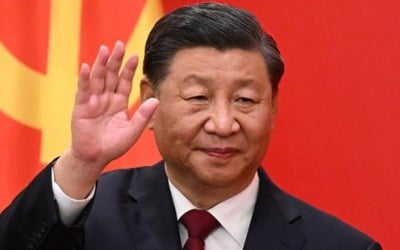입력2006.04.03 01:52
수정2006.04.03 01:54
"목에 걸린 올가미가 죄어지는데 '그 애는 무관하니 내려놔라'라고 누군가 말했다."
올해 91세의 제임스 캐머런이 75년전인 1930년 8월 7일 16세때 인디애나 매리언에서 어린이까지 데리고 나온 백인 군중 2천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교수형에 처해지기 직전 구사일생한 순간이다.
지난 11일(현지시간)자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캐머런의 얘기는 1882년부터 1968년까지 미 전국에서 4천743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미국의 "수치스러운 전통"인 군중 교수형(lynching)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흑인의 지울 수 없는 기억이다.
캐머런은 13일 미 상원이 그동안 이 교수형을 연방범죄로 규정해 금지하는 법안의 입법을 막은 것에 대한 사과 결의를 채택한 자리에 다른 희생자들의 후손들과 함께 참석했다.
그러나 자신의 목에 서늘하게 걸렸던 밧줄 한 토막을 아직 갖고 있는 캐머런은 사과가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미 상원이 1891년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 때 린치 금지법이 첫 발의됐던 때에 비해 1세기나 늦긴 했지만, 이날 사과 결의를 한 것은 최근 미 전국에서 일고 있는 인종관련 과거사 규명 및 화해 움직임과 이어져 있다고 미 언론은 보도했다.
이 법은 역대 7개 행정부에서 수없이 시도된 가운데 3차례는 하원을 통과하기도 했으나 남부 출신 상원의원들이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로 최종 입법을 막았다.
미 상원의 결의는 특히 미국 역사에서 흑인이 당한 부당한 처우에 대한 의회 차원의 최초의 사과이기도 하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상원은 미국의 인디언 원주민과 2차대전 때 수용소에 수감됐던 일본계 미국인 등에 대해선 이미 사과했다.
그러나 공식사죄위원회(CFA)라는 단체는 상원의 이번 사과로 그치지 않고 노예제를 포함해 미국 흑인에 대한 과거사 전반에 대한 의회의 사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 위원회의 마크 플래닝 법률고문은 말했다.
린치는 사전적으론 사형(私刑)을 말하지만, 미국에선 주로 흑인을 대상으로 군중들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 때때로 사법 당국의 방관속에 보복을 가하거나 협박하기 위해 동네 나무나 가로등 등에서 교수형에 처한 일들을 말한다.
희생자들은 사살되거나 교수형에 처해지기전 눈알이 도려내지고, 집게로 이가 뽑히고, 구타당하거나, 말뚝에 묶여 화형되고, 사지가 절단되거나 거세당하는 등의 잔혹행위도 당했다.
희생자중엔 범죄 용의자도 있었지만 백인 남자에게 말대꾸했다거나 백인여성을 쳐다봤다는 이유만으로 희생된 경우도 많았으며, 특히 땅을 가진 부유한 흑인들이 본보기로 목표물이 됐다.
린치는 일종의 축제같이 어린이들도 구경했고, 장사꾼은 음료수를 팔고, 사형장행 열차가 특별편성되기도 했으며, 주민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학교와 회사가 쉬거나 사형 장소와 시간에 대한 신문광고가 실렸고, 시체는 며칠이고 현장에 걸린 채 '기념물'로 귀나 손가락, 발가락이 훼손되기도 했다.
윌리엄 코언 전 국방장관의 부인이자 CFA의 회원이기도 한 재닛 랭허트 코언은 "상원의 사과가 자신의 가족의 아픈 기억을 지울 수는 없겠지만 미국이 세계의 인권개선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외이미지 개선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과거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민주주의 증진이나 독재로부터 해방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ydy@yna.co.kr

![G7, 2035년부터 석탄발전 중단…에너지 27% 의존 日 '초비상' [원자재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6853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