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한미은행, 산업자본 금융진출 '시금석'
산업자본의 금융진출을 가름하는 대표적인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한미은행의 소유권을 둘러싼 대우와 삼성 양대그룹의 쟁패도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다.
지난해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10%의 보유지분을 매각하면서 막이 오른
한미은행 쟁탈전은 대우와 삼성간 "물러설수 없는 2파전" 양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연말만해도 삼성화재를 동원한 삼성측이 모두 17.6%의 지분을 확보해
국내 최대주주로 떠올랐으나 이내 대우측이 계열 6개사를 동원해 8%를 추가로
사들이면서 최대주주 자리를 재탈환하는 등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양대그룹의 금융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이수빈 생명회장과 이경훈
대우아메리카 회장의 설전도 볼만하다.
"대우는 한미은행의 대주주가 될수 없다"는 주장에 "당초부터 한미은행은
대우 것"이라는 반격이 바로 튀어나왔다.
두 그룹이 자존심을 건 한판 쟁패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지분율은 BOA와 대우가 똑같이 18.55%로 가장
높고 삼성이 17.6%로 뒤를 잇고 있다.
불과 32만주를 더 사게 되면 동율인 18.55%를 확보하게 되는 삼성으로서는
어떤 형태건 지분율을 다시 끌어올릴 것이 확실하다.
주목되는 것은 정부의 태도다.
정부는 지난해 BOA가 지분을 매각할 당시 은행법 시행령을 고쳐 누구든
해외합작선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수 없도록 해두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같은
규정을 고집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작성한 일정에 의하더라도 당장 내년말이면 합작은행 설립이 자유화
된다.
더구나 금융개혁위원회가 설치되기로 하는 등 금융의 빅뱅이 도마에 올라
있다.
기왕에 주인이 있는 은행이라면 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은 뻔하다.
BOA가 언제쯤 추가적인 지분 매각을 단행할지 또 2차 매각에서도 삼성이
지분을 인수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삼성측의 자신있는 태도를 보면 BOA측과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이라는
느낌도 주지만 현재로서는 팽팽한 양파전이라고 할수 밖에 없다.
5%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한전선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도 관건이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3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뉴욕엔 왜 유독 비계가 많을까?…도시 흉물 만들어낸 낡은 규제 [나수지의 뉴욕리포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67189.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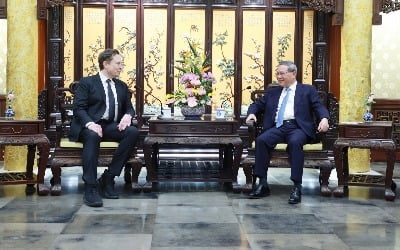


![3대지수 실적시즌 기대에 상승…테슬라 15%대 급등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6673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