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이 끝나고 난 뒤, 연극이 시작된다…두 얼굴의 마포 동네책방
책이 머무는 집
서울 염리동 서점극장 '라블레'
낮엔 세계문학 서점, 밤엔 극장
문학연구자와 연극인 함께 운영

서울 염리동에 있는 이곳은 서점이자 극장입니다. 통창으로 햇살이 쏟아지는 겉모습만 봐서는 평화로운 동네 책방입니다. 세계문학, 그러니까 번역서 중심이라는 것 정도만 여타 서점과 다르고요. 서점 안쪽 커튼을 걷으면 또 다른 얼굴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책장으로 둘러싸인 연극 무대죠.
지난 8월엔 안톤 체호프의 단편 소설을 재해석한 연극 ‘검은 수사’가 공연됐어요. 저녁 6시에 책방은 문을 닫았습니다. 잠시 뒤 다시 문을 연 이곳은 극장으로 변합니다. 관객들이 찾아오고, 책을 팔던 서점 대표는 티켓을 나눠주기 시작하지요. 연극 ‘검은 수사’는 학자 코브린이 자신의 눈에만 보이는 검은 수사의 환영을 부정하고 또 좇으면서 꿈과 현실, 천재성과 평범성을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극은 1인극으로 진행됐어요. 코브린, 과수원 주인 페소츠키, 그의 딸 타냐와 서술자까지 모두 한 명의 배우가 연기했죠. 배우의 열연뿐 아니라 마치 책 속에 들어온 듯한 공간도 몰입감을 높였어요. 책장은 그대로 무대 장치가 됐습니다.
서점극장 라블레는 문학을 전공하고 각각 문학연구자와 연극인으로 살아오던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하는 책방이에요. 문학과 연극이 결합된 공간을 꿈꾸게 된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겠죠. 처음부터 IWMW의 건축가들과 함께 ‘서점으로 위장한 소규모 극장’을 콘셉트로 공간을 설계했다고 해요. 무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벽면 서가를 주로 배치했고, 핀 조명 등으로 무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죠. 책방 이름은 16세기 프랑스 작가 프랑수아 라블레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대표의 설명이 마치 연극의 명대사처럼 인상적이었어요.
“프랑수아 라블레는 세계문학사상 가장 커다란 규모의 웃음, 강력한 풍요와 파괴를 지닌 작가입니다. 21세기 서울에서 책방을 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세계문학의 수호성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작가의 가호를 받고자 했습니다. 일종의 책방계 ‘풍년슈퍼’ 같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동네 책방으로 살아남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한국은 인구수와 독서인구에 비해 놀랄 만큼 다양한 문학이 번역되고 빠르게 출판되는 곳”이라는 게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문학의 독자로서는 그야말로 황금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황금시대를 더 깊이 누리기 위해 서점극장 라블레에서는 매주 목요일 열리는 낭독회를 비롯해 연극과 책을 오가는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서점극장 라블레에서는 니콜라이 고골의 원작을 바탕으로 연극 ‘외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검은 수사’는 내년 여름쯤 정기 공연으로 무대에 올릴 계획이라고 하고요. 신작들도 준비 중이라 하니, 라블레가 보여줄 이야기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만리포 홍시 같은 노을 속 당신! [고두현의 아침 시편]](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01.34702831.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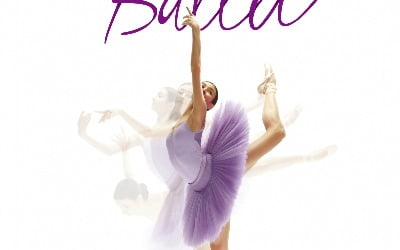



!["버핏, 애플 팔고 '9조' 베팅한 곳이…" 6개월 만에 깜짝 공개 [대가들의 포트폴리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29398.1.jpg)








![최강창민 '늦바람' 들게 한 '벤자민 버튼'…"삶 아름답게 정의해드립니다" [종합]](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ZA.3673518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