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HMM 실적 취해 있을 때 터미널 30개 늘린 '해운 빅3'
'물류 대란' 발빠르게 대처
HMM, 터미널 한곳 추가

한국경제신문이 5일 해양수산부 자료와 각사 연차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선복량 기준 세계 1~3위 해운사인 머스크, MSC, CMA-CGM이 2021년 한 해 동안 늘린 항만 터미널은 2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머스크가 2020년 59개에서 지난해 75개로 가장 많이 늘렸고 MSC와 CMA-CGM도 각각 39개, 41개에서 42개, 50개로 확대했다.
같은 기간 HMM이 보유한 항만 터미널은 7개에서 8개로 단 한 개 늘었다.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GTO)인 PSA(싱가포르)와의 공동 투자로 싱가포르에 전용 터미널을 확보한 것이 유일했다. 한진해운이 파산하기 직전 해인 2016년 한국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항만 터미널 수(16개)와 비교하면 반토막 난 수치다.
항만 터미널은 선대와 함께 해운사의 역량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10~20년을 주기로 짧은 호황과 긴 불황이 반복되는 해운업에서 항만 터미널은 불황을 이겨내는 ‘방패’ 역할을 한다. 선박이 제시간에 도착하는 정시성을 높이고 물류비의 30% 수준인 하역비 절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7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낸 HMM의 실적에 안주하는 사이 글로벌 해운사들은 두세 단계 앞서나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선복량이 작년 말 기준 HMM의 다섯 배에 달하는 머스크는 지난해에만 항공 물류, 전자상거래 등 분야 업체 6개를 인수하고 물류창고만 85개를 새로 확보하는 등 땅과 바다, 하늘을 잇는 종합 물류망을 구축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메탄올을 연료로 활용하는 친환경 대형 컨테이너선을 발주하며 해운업계 탄소중립 경쟁에도 불을 댕겼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주 90시간 굴려도 괜찮네'…머스크는 '솔로 공대남'만 뽑았다 [백수전의 '테슬람이 간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01.30283174.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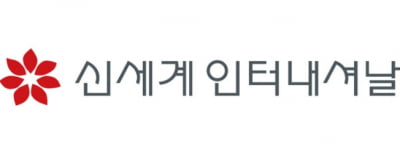


![3대지수 실적시즌 기대에 상승…테슬라 15%대 급등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6673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