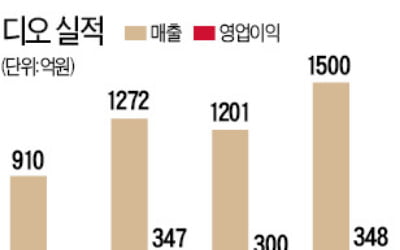"복사 밀려 공판 진행 못 해"…'아날로그 재판' 의 민낯
증거·공판 기록 종이로 확인해야
공판 검사실 복사기 일정 꽉차
사건 기록 복사하는데 꼬박 3일
신청후 한달 뒤 복사하러 가기도
형사사건 전자소송 앞당겨야
법조계 "피고인 구속해놓고
복사 하다가 구속기간 끝날 판"

이씨 측이 검찰의 사건 증거기록을 복사하지 못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통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 또는 부인하지만 이날 공판에서는 아무런 절차도 진행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형사사건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지 못해 재판이 지연되는 이런 일들은 정보기술(IT) 강국 한국의 ‘아날로그 재판’을 상징하는 풍경이다. 2010년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현재 민사·행정 등의 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돼 관련 문서를 컴퓨터 파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형사소송은 아직도 종이기록으로 재판이 이뤄진다. 지난해 형사사건을 전자화하는 내용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 시점은 일러도 2024년이다.
검찰, 피고인, 재판부 등 재판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는 방대한 증거·공판기록 등을 종이 원본으로 확인해야 한다. 피고인이 검찰의 증거기록을 복사하려면 사전에 검찰에 신청하고, 정해진 시간에 공판 검사실을 방문해 원본을 복사해야 한다. 공판이 진행되면서 조서나 증거목록이 추가·변경되기 때문에 기록 복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한 사건 기록이 2000장씩 되는 사례도 많은데, 모두 복사하는 데 꼬박 3일이 걸린다”며 “공판 검사실 복사 일정에 따라 신청 후 한 달 뒤에 복사하러 갈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사를 완료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기록을 놓고 공소사실이나 각 증거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시간이 촉박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8일 열린 ‘머지플러스’ 사건의 첫 공판에서도 피고인 측이 기록을 복사하지 못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발언하지 못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은 1월 6일 접수됐으나, 공판 검사실에 복사기가 몇 대 없고 일정이 꽉 차 있어 한 달 뒤에나 복사할 수 있었다”며 “공판 전날인 7일까지 복사를 계속했으나 기록 21권 중 15권만 복사했고, 나머지 기록은 2주 뒤 복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공판에서 성보기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구속해 놓고 기록 복사도 못 하면 복사만 하다가 구속일수가 끝나버리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비효율 때문에 “형사사건을 전자소송으로 바꾸는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성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보고서를 통해 “2016년 기준으로 기록 한 건의 열람·복사 신청 처리를 위해 법원 인력이 투입되는 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하면 연간 20만 시간”이라며 “100명 넘는 법원 인력이 1년 내내 오직 형사사건의 기록 열람·복사 업무에만 종사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대형 사건은 수사기록만 수십만 쪽이다.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부당승계 사건은 검찰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법원에 제출한 서류만 20만 쪽에 달해 트럭이 동원됐다. 기록 20만 쪽을 복사한다면 장당 500원씩 1000만원이 필요하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