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 혼란의 부동산시장…이번에도 집 못 산 김 과장의 2019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하락장 초입서 대세상승까지
되돌아본 2019년 부동산시장
되돌아본 2019년 부동산시장

◆3월 - 춘래불사춘
연초만 해도 상승론과 하락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하지만 봄에 접어들수록 시장의 분위기는 명확해졌다. 서울 집값은 지난해 말부터 5개월 내리 떨어졌다. ‘폭등론자’들은 절멸한 듯 자취를 감췄다. 그 무렵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 매매가격은 14억원대까지 떨어졌다. 최고가 대비 4억5000만원가량 급락했다. 높아진 종합부동산세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앞다퉈 집을 팔고 있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매각해야 해당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12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올랐다.
‘형님’ 강남이 힘을 쓰지 못하자 주변 집값도 맥을 못 췄다. 송파구에선 1만 가구에 가까운 ‘헬리오시티’ 입주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폭삭 주저앉았다. 중형 면적대 단기 전셋값이 5억원대까지 떨어졌다는 얘기까지 들렸다.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던 대세 상승장이 이대로 마감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김 과장은 더 기다리기로 했다. 강동에서 더 큰 규모의 입주가 기다리고 있어서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물량이 서울 부동산시장을 덮치고 있었다.

정부가 경기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에 신도시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전년 말 발표한 남양주 왕숙1·2와 인천 계양, 하남 교산과 함께 다섯곳의 3기 신도시가 모두 공개된 셈이다. 이름도 거창한 ‘30만 가구 공급계획’은 이렇게 완성됐다. 모두 김 과장이 출장이나 나들이를 다니면서 숱하게 지나쳐본 서울 지근거리 지역들이다. 집값이 떨어지는 와중에 대량 공급계획까지 나오면서 서울 부동산시장에 사형선고가 내려지는 듯했다. 국토부 장관은 신도시 계획을 절대 철회하지 않겠다고 못 박기도 했다. 김 과장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부동산은 끝났다.’
지방에선 아파트 수백채를 굴리던 갭투자자들이 파산했다는 뉴스가 하나둘 들려왔다. 하락장의 전조다.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 같은 단어도 슬슬 뉴스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집값이 너무 올라 걱정이라는 게 불과 1년 전 이야기였는데 이젠 매매가격이 전세가격을 밑도는 곳이 숱했다. 김 과장은 지난해 매매계약이 파기됐던 마포의 한 단지 내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다. 시세는 그새 1억원 이상 조정을 받았다. 김 과장은 좋은 물건이 있다는 중개업자의 말을 대충 흘려들으면서 더 알아보겠다고 튕겼다. 통화를 끝내기 무섭게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절충 가능.’

‘강남 집값, 8개월 만에 상승 전환’. 김 과장이 사무실에서 본 포털사이트 뉴스 제목이다. 은마아파트는 다시 20억 선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부동산투자의 종착지인 압구정에선 연일 신고가가 경신됐다. 꼭 1년 전처럼 여름이 되자마자 집값에 다시 불이 붙었다. 하지만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상승 전환했다는 강남의 반등폭도 미미했다. 0.01%. “기자놈들 침소봉대하는 건 여전하다니까.” 김 과장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
방송과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한 뉴스에 아내는 조바심을 드러냈다. 김 과장에게 자꾸만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눈치를 줬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 2000만원을 들고 대전에 내려가 재개발투자로 1년 만에 9000만원을 벌어 왔더라는 무용담과 함께. 김 과장은 그런 아내가 한심하다는 듯 핀잔을 줬다. “당신이 부동산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분위기는 두 달도 못 가.”
◆8월 - 분양가 상한제
상승세가 두 달째 이어지면서 서울 모든 지역 집값이 고개를 들었다. 멸종한 줄 알았던 폭등론자들도 돌아왔다. 그들의 주문 때문인지 강남 신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기어이 3.3㎡당 1억원을 넘겼다. 김 과장이 사는 목동 아파트값도 연초보다 1억~2억원은 올랐다. 물론 집주인만 웃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신청하겠다는 이야기가 오갔고 날마다 건설사들의 재건축 설명회가 열렸다. 전셋값도 야금야금 올랐다.
정부도 결국 집값이 상승 국면이라는 걸 인정했다. 그리곤 곧바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냈다. 재개발·재건축단지 조합원들은 곧장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입주권 가격은 날마다 떨어졌지만 신축 아파트 가격은 거꾸로 올랐다. 상한제로 공급이 위축되면 희소가치가 높아질 거란 기대에서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를 잡기엔 매매가격이 너무 높았다. 인근 신길뉴타운만 해도 새 아파트 중형 면적대의 가격이 14억원을 넘기고 있었다. 그래서 김 과장은 청약시장에 뛰어들기로 했다. 상한제가 본격 작동하면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게 뻔하니 당장 분양하는 단지부터 무조건 찔러보기로 마음먹었다.
![[집코노미] 혼란의 부동산시장…이번에도 집 못 산 김 과장의 2019년](https://img.hankyung.com/photo/201912/01.21321612.1.jpg)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연 1.25%로 내려갔다. 청약경쟁률은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김 과장처럼 상한제 유예기간 중에 내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가 몰렸다.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최장 10년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김 과장은 연거푸 물을 먹었다. 그의 청약가점은 48점. 무주택기간 7년(16점)에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17점)과 가구원수(3인·15점)를 더한 점수다. 하지만 10월 이후 서울에서 청약을 받은 단지들 가운데 당첨 커트라인이 48점을 밑도는 아파트는 한 곳도 없었다. 시세 차익만 10억이 넘는다는 강남 ‘로또 아파트’도 혹시나 싶어 찔러봤지만 ‘커트라인’과 20점 이상 차이가 났다. 만만하다고 생각한 강북 아파트 경쟁률이 200 대 1에 근접했다. 가점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었다. 남들보다 빠르게 나이를 먹거나, 아이를 더 낳거나. “당신이 육아휴직 할 거면 낳아줄게.” 아내는 싸늘했다.
◆12월 - “막차 출발합니다”
연달아 아홉 번의 청약에서 낙첨한 김 과장은 생각을 고쳤다. “강남은 오늘이 제일 싼 거야.” 지금이라도 강남에 진입하면 앞으로의 상승분을 취할 수 있겠다는 계산에서다. 조금 무리해서 적금을 모두 해약하고 대출을 최대한 받으면 잠실 소형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세를 안고 사는 게 가능할 듯 보였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상담도 여러번 받았다.
하지만 기습 발표된 ‘12·16 대책’은 이 같은 수고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집을 알아보기도 전에 15억 이상 주택의 담보대출이 막혔다. 강남행 막차가 어제 떠났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16억짜리 급매물이 나왔는데 보러 오지 않겠느냐는 중개업소의 문자에 김 과장은 아무 답도 하지 못했다. 차라리 살던 집을 사자고 아내가 제안할 때쯤 발표된 한국감정원 통계에선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절반으로 줄었다. “내년엔 정말 떨어지겠지.” 다시 바닥을 기다리는 김 과장의 2019년이 저물고 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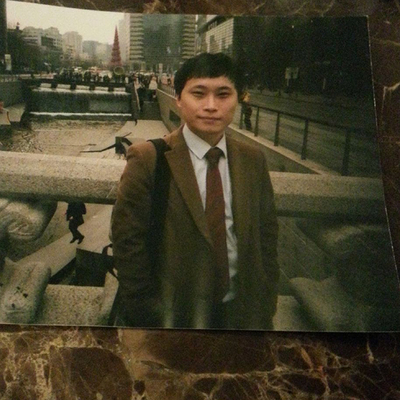
![[집코노미TV] 위례신도시 상가, 은퇴자는 '쪽박'…건설사는 '대박'](https://img.hankyung.com/photo/201912/01.21308604.3.jpg)
![[집코노미TV] 집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https://img.hankyung.com/photo/201912/02.21300526.3.jpg)
![[12·16 대책 후폭풍]"대출 규제 피하자"…14.99억 매물 등장](https://img.hankyung.com/photo/201912/01.21289542.3.jpg)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