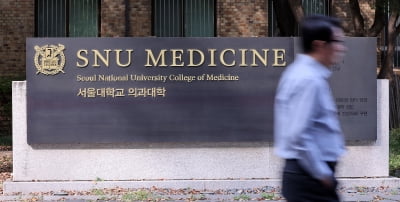구조조정 필요한 현대차, 노조 요구 수용 가능성 낮아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이틀에 걸쳐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이날 일부 특수 공정 조합원 대상으로 투표를 시작하고 30일에는 전체 5만명 가량의 조합원 대상 투표가 이뤄진다. 노조 집행부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현대차 노조의 요구사항은 성과금 지급과 정년 연장, 고소 취하, 해고자 복귀 등이다. 기본급을 15만1526원(전년 대비 6.8%) 인상하고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6450억원의 30%를 성과급으로 내놓으라 주장하고 있다. 만 60세인 정년도 국민연금 수령 직전 연도(64세)로 연장하고 해고자의 복직, 고소·고발 철회도 요구했다. 정규직 1만명 추가 채용, 납품단가 인하 근절 등의 ‘특별요구’도 담았다.
파업 찬반 투표는 30일 오후 8시 20분까지 진행된다.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나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한다. 현대차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사측의 요구안 수용 의지가 확인되면 교섭에 응할 수 있다”며 현대차를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현대차가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쉽지 않다.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탓이다.
올해 2분기 현대차의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한 110만4916대를 기록했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 영향으로 해외 판매량이 10.1% 줄었다. 영업이익률도 지난해 2.5%까지 떨어졌다. 올해 2분기에는 그나마 4%로 확대됐는데, 펠리세이드 등 수익성이 좋은 SUV를 선보인 덕분이다. 일본 도요타 등이 8%대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것에 비하면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직원 연봉 자체도 높다. 지난해 도요타의 직원 평균 연봉은 7800만원 수준으로, 9200만원인 현대차보다 현격히 낮다. 때문에 현대차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는 지난해 14.8%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8.2%보다 높은 것은 물론, 도요타(5.9%)보다도 2.5배 높다. 회사의 성장 동력을 높은 연봉이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생산 공정의 발전과 전기차의 부상으로 인력 수요가 줄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현대차 특별 고용안정위원회는 2025년이면 약 3만5000명인 현대차 생산직 가운데 20%(7000명)는 잉여인력이 된다고 분석했다. 차량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근로자의 자연 감소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업계는 가뜩이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현대차가 임금 인상과 성과금 지급, 정년 연장, 추가 채용 등의 요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의 파업을 감수하더라도 정년에 도달한 생산직 근로자의 자연 감소를 고수하는 편이 기업의 발전에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생산직의 40% 이상은 정년이 다가온 50대”라며 “회사의 생존과 노조의 생존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올해 임단협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오세성의 첫차픽] 베뉴, 가성비 초점 맞춘 1인가구용 SUV](https://img.hankyung.com/photo/201907/01.20197884.3.jpg)


![[르포] '윤석열' 지우는 대구 서문시장…"尹 욕하는게 싫어 사진 뗐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K.3887887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