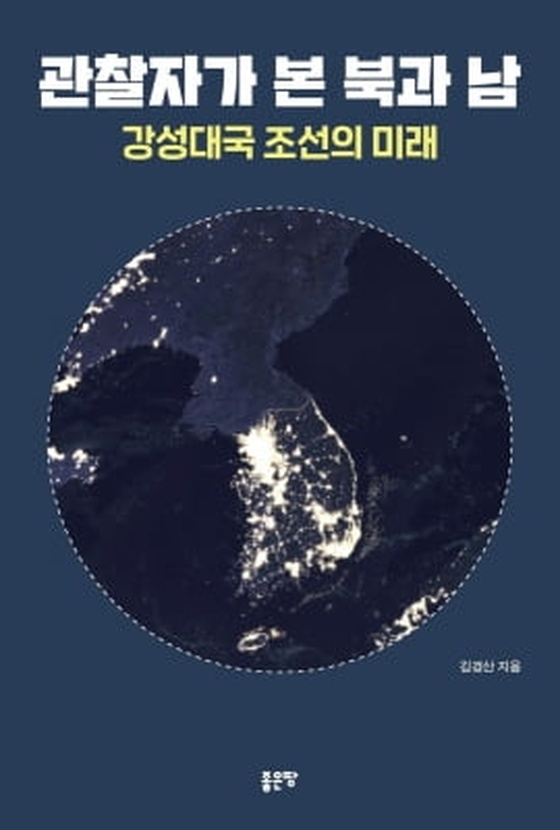정부가 억지로 떠맡긴 호텔, 40년 만에 '수출 효자' 되다
글로벌 브랜드로 '발돋움'
면세점은 세계 최고 경쟁력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은 이병철 회장과 신격호 회장을 차례로 청와대로 불렀다. 롯데에는 반도호텔을, 삼성에는 영빈관을 맡아달라고 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적자 호텔들이었다. 기업인들은 당황했다. 제조업을 하고 싶었다. 신 회장은 제철사업을 꿈꿨고, 삼성은 전자사업 확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기업인들이 주저하자 정부는 국세청 등을 동원해 압박했다. 결국 1973년 호텔을 떠맡기로 했다. 두 번의 오일쇼크로 1979년에야 롯데호텔(옛 반도호텔)과 신라호텔(옛 영빈관)이 문을 열었다. 강제로 떠맡았지만 기업인들은 미래를 향한 포석을 깔았다. 1980년대 초 호텔을 기반으로 면세점사업에 진출했다.
두 호텔이 문을 연 지 40년. 롯데는 30개, 신라는 15개 호텔을 보유한 호텔 그룹으로 성장했다. 한국 기업인의 숙명인 해외 진출은 후대가 담당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미국 러시아 등 6개국에 롯데호텔을 수출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본격적으로 해외 개척을 시작했다. 계획은 더 공격적이다. 롯데와 신라는 내년까지 위탁 운영을 포함, 해외에 30개의 호텔을 열 계획이다. 신 회장과 이 사장은 호텔을 기반으로 한 면세점사업을 연 11조원의 수출산업으로 키우는 데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정부가 억지로 떠맡긴 사업이 기업인의 손에서 수출산업으로 변신한 게 한국 호텔산업 40년의 역사다.
'특혜·독점' 오해 받던 호텔산업, 이젠 글로벌 호텔 체인과 경쟁
정부로부터 떠안은 호텔사업을 수출산업으로 바꾸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출발부터 그랬다. 노하우도 없었고, 국민의 시선도 곱지 않았다. 롯데와 삼성은 호텔산업에 뛰어든 뒤 “대기업에 특혜를 줬다”, “호텔산업이 오너들의 놀잇감으로 전락했다” 등 숱한 비아냥거림을 들어야 했다. 사업 자체도 큰 이득이 없었다. 제조업에 비하면 매출은 턱없이 적고 이익을 내기 힘들었다.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은 “큰 이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란 것을 신라호텔을 해보고 알았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호텔을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물론 손쉽게 운영할 수도 있었다. 메리어트, 힐튼 등 글로벌 체인 호텔의 브랜드를 쓰고 운영을 위탁하면 됐다. 하지만 쉬운 길을 가지 않았다. 이왕 하는 것이라면 독자 브랜드로 승부를 보고 싶었다. ‘호텔업이 서비스산업 중 가장 어렵다’는 말도 기업인들의 승부욕을 자극했다. 한국에도 제대로 된 호텔 브랜드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했다. 이렇게 시작한 롯데와 신라의 경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들이 뿌린 씨는 후대에서 꽃을 피웠다. 글로벌 체인 호텔과 경쟁해도 뒤지지 않는 최고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 노하우를 갖게 됐다. 해외에서 먼저 찾아와 “우리 호텔을 롯데, 신라 브랜드로 운영해 달라”고 할 정도다. 호텔신라는 해외에서 위탁운영할 브랜드도 새로 내놨다. ‘모노그램’이다. 롯데는 이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세 곳에서 롯데 이름을 걸고 위탁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수출이다.
호텔을 기반으로 성장한 면세점은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췄다. 롯데는 국내뿐 아니라 베트남 태국 호주 등 6개국에서 20곳의 매장을 보유한 글로벌 2위 면세점으로 성장했다. 신라는 인천공항을 비롯해 싱가포르와 홍콩까지 아시아 3대 허브 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해외 매출만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섰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면세점을 세계 1위로 키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서비스 업종이며 롯데가 삼성전자와 같이 세계 1위에 올라설 수 있는 사업”이라고 했다.
서원석 경희대 호텔관광대 교수는 “로컬(현지) 호텔이 글로벌 호텔 체인과 동등하게 경쟁하는 것은 일본을 제외하곤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들다”며 “이는 제조뿐 아니라 서비스산업에서도 한국식 모델이 성공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매파 의사록'에 얼어붙은 투심…엔비디아 1000달러 돌파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ZA.36589088.1.jpg)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