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아웃사이더
![[천자칼럼] 아웃사이더](https://img.hankyung.com/photo/201312/AA.8153012.1.jpg)
윌슨은 약관 24세에 펴낸 ‘아웃사이더’(1956년)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출간 1년 반 만에 14개국어로 번역됐고, 한국 일본은 물론 아랍권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자고나니 유명해진 셈이다. 그 덕에 윌슨은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의 존 J 오스본, 훗날 노벨문학상을 수상(2007년)한 도리스 레싱 등과 함께 50년대 앵그리영맨의 기수로 떠올랐다.
‘아웃사이더’에서 윌슨은 니체, 헤세, 로렌스, 카뮈, 사르트르, 헤밍웨이 등 19~20세기 대표 작가들의 작품 속 인물들에게서 일관된 아웃사이더 기질을 끄집어 냈다. 아웃사이더란 일상에선 무관심하고 비현실적이지만 존재에 대해선 끝없이 집착하는 정신적 국외자다. 이 책이 등장하자 당시 비평가들은 전기충격을 받은 듯했다고 한다. 대학 문턱도 못 가본 스물네 살짜리 노동자가 독학만으로 그런 해박한 식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웃사이더’의 성공은 되레 윌슨을 평생 아웃사이더로 살게 만들었다. 언론이 그를 띄웠지만 다시 진창에 밀어넣을 것을 예감하고 은둔한 것이다. 그의 관심사는 비평보다는 살인, SF, 우주, 불가사의 등 오컬트로 기울었다. 때문에 비판자들은 ‘아웃사이더’ 외엔 그의 모든 것을 쓰레기일 뿐이라고 폄하한다. 요즘 말로 ‘듣보잡’이 기성 평단을 휘저은 데 대한 반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윌슨의 저작들이 그렇게 허접스런 것은 아니었다. 팬들은 그의 다양한 관심이 바로 아웃사이더적 관점이라고 본다. 소설 ‘정신기생체’는 필립 K 딕 등 젊은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잔혹:피와 광기의 세계사’에선 테러리스트의 원형을 ‘산의 장로’에서 찾고, 이들이 미치광이가 아닌 ‘확신인간’이라는 관점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세계의 불가사의’, ‘아틀란티스의 유산’, ‘우주의 역사’, ‘시간의 발견’ 등의 저작이 있다.
콜린 윌슨이 82세를 일기로 지난 5일 타계했다. 무려 150여권의 저작을 남겼으니 해마다 2~3권씩 출간한 셈이다. 국내에 번역된 책만도 30여종이나 된다. 집집마다 서가를 찾아보면 윌슨의 책이 한 권쯤은 있을 것이다. 인사이더들이 불편해 했던 어느 아웃사이더의 명복을 빈다.
오형규 논설위원 ohk@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한경에세이] 꼬인 문제를 푸는 전략 노하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36609646.3.jpg)

![[토요칼럼] 염증 같은 나라!…플라톤의 저주 피하려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AA.36822992.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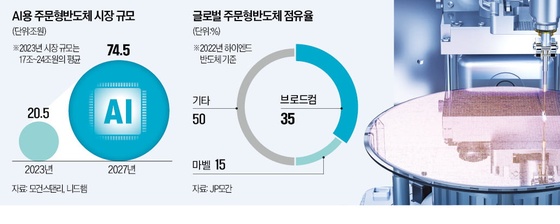


![[단독] '2조' 도박사이트 덮쳤는데…비트코인 1500개 실종](https://timg.hankyung.com/t/560x0/data/service/edit_img/202405/00bf91532a4bd70bc2adbaf17c8232a8.jpg)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오늘의 arte] 예술인 QUIZ : '드라마 1882' 선보인 이슬람 작가](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AA.3682076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