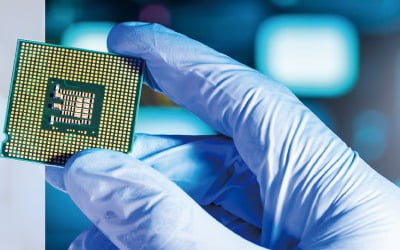산업현장 덮친 공급과잉 '쓰나미'…LGD 팀장급 이상 20% 줄여
LG디스플레이는 올 들어 주로 임원들이 맡던 ‘담당’이라는 직책을 20% 가량 없앴다. 조만간 차·부장급 보직인 팀장 수도 600여개에서 490개 가량으로 18% 이상 줄일 계획이다. 2010년 4분기부터 6분기째 적자를 내자 1999년 창사 이래 사실상 첫 인원 감축에 나선 것이다. 글로벌 불황의 여파가 국내 산업 현장을 덮치고 있다. 수요 부족으로 재고가 쌓이자 감산과 감원이 이어지고 있다. 공급 과잉 ‘쓰나미’는 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조선·해운·철강에 이어 디스플레이와 석유화학업계까지 휘청거리고 있다. 태양광 등 신성장 산업도 고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등 몇몇 업종의 호황이 전체 산업 경기를 좋게 보이게 만드는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업종별 선두 기업들은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극심한 불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산업 전체를 볼 게 아니고 조선 등 개별 업종별로 투자 과잉 등을 체크해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전체 실적만 갖고 낙관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체질 개선이나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때라는 설명이다.
◆ 삼성전자 디스플레이사업부 분할…임원 17% 줄이고 독자생존 모색
글로벌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대표적인 전자산업 분야는 LCD(액정표시장치) 패널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직원 1만6000여명, 매출 23조원 규모의 디스플레이사업부 분할을 결의했다. 지난 2년간 누적된 적자에 업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분사를 통해 독자 생존 방안을 찾도록 한 것이다.
지난달 1일자로 분사된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의 합병을 앞두고 조직·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 2010년 말 77명이던 디스플레이 부문 임원 수를 지난해 말 64명으로 17% 감축했다. LG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다. 임원급 조직을 20%가량 없애고 팀장 수도 18% 이상 줄일 계획이다. 6분기 연속 적자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된 탓이다.
LCD업계의 위기는 2010년 시작됐다. 남아공 월드컵을 앞두고 특수를 노린 업체들이 앞다퉈 생산량을 늘렸지만 수요가 기대만큼 따르지 않았다. 게다가 유럽발 재정위기가 확대돼 수요가 둔화되자 재고가 쌓였다.
시장조사업체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대형 LCD 공급과잉률은 2009년 2.2%에서 2011년 13.4%로 급증했다. 여기에 BOE, CEC판다, 차이나스타 등 중국 업체들이 지난해 말 LCD 생산에 돌입하자 패널값은 곤두박질쳤다. 2010년 4월 340달러였던 42인치 LCD 패널 가격은 지난해 11월 206달러까지 추락했다.
올해 업황도 밝지 않다. 1분기 LG디스플레이가 적자를 기록했으며 삼성디스플레이도 급성장 중인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을 제외하면 사실상 적자를 이어갔다. 올림픽을 앞두고 업황이 반등할 것이란 예상도 있지만 유럽발 위기가 계속되고 있어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국내 업체들은 이 같은 공급 과잉 속에서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중국 투자를 본격화해야 할 판이다. 중국 내 TV 생산량이 급속히 늘어 현지 공급의 필요성이 커진 것. 중국 정부가 LCD 수입관세를 높이며 압박하고 있어 업체들은 국내 설비를 이전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남기만 지식경제부 주력산업정책관은 “유럽 위기가 계속 여진으로 남으면서 불황이 길어지고 있다”며 “경기가 하락할 땐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연구개발에 집중해 다가올 상승기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도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LG화학과 삼성SDI가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SK에너지와 현대중공업이 도전장을 던졌지만 시장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LG화학은 GM 볼트와 현대차 쏘나타 하이브리드 등의 판매 부진으로 배터리 납품량이 줄어 지난 1분기 실적이 급감했다. 하이브리드카 시장의 수익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면서 한국 기업 간 과잉투자 경쟁까지 벌어질 조짐이다.
정인설/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