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0% 네바다州에 자회사 설립…美서 번 돈 '집결'
본사 있는 캘리포니아 재정난
342억불 벌어 세금 33억불
이익의 9.8%만 납세…미국기업 평균 세율은 24%
애플 "주주 위해 절세" 주장
애플에 본격적으로 현금이 쌓이고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2006년. 애플은 미국 네바다주 북서쪽에 있는 작은 도시 리노에 ‘브레번캐피털’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했다. 사과 품종 중 하나인 브레번의 이름을 따 만든 이 회사는 애플의 수익을 모아 관리하고 투자하는 역할을 맡았다.
미국 내에서 누군가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을 구입하면 수익은 브레번캐피털이 관리하는 계좌에 예치된다. 브레번캐피털은 이 돈으로 주식, 채권 등 전 세계 금융상품에 투자한다. 브레번캐피털이 설립 이래 현재까지 이자 및 배당수익으로 벌어들인 돈은 약 25억달러. 만약 브레번이 캘리포니아에 있었다면 8.84%의 법인세를 냈겠지만 이곳에서는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 네바다는 법인세율이 0%이기 때문이다.
◆“조세피난처를 활용하라”
뉴욕타임스(NYT)는 애플이 아이폰 제작에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네바다주로 회계 기능을 옮겨 세금을 줄였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전략은 애플이 전 세계에서 매년 수십억달러의 세금을 회피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네바다 외에도 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버진아일랜드 등에도 자회사를 설립해 세계 각국에 낼 세금을 줄이고 있다. 애플의 수익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지난해 전 세계에 걸쳐 납부한 세금은 33억달러에 불과했다. 세전이익 규모가 3분의 1에 그친 2009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유럽, 아프리카, 중동에서 소비자가 아이튠즈를 통해 음악이나 방송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하면 해당 거래는 룩셈부르크의 자회사 ‘아이튠즈SARL’ 을 통해 이뤄진다. 룩셈부르크는 낮은 세율로 아이튠즈 거래를 유치해 일종의 ‘박리다매’로 세수를 거둬들이고, 애플은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거래가 이뤄졌다면 훨씬 비쌌을 세금을 크게 줄이는 ‘윈-윈 전략’인 셈이다.
◆디지털시대에 뒤처진 세제
애플의 절세는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산업시대에 만들어진 세제의 허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NYT는 분석했다. IT 기업들은 소프트웨어나 특허 같은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하는 로열티나 다운로드 음악과 같은 디지털 제품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 자동차나 전자회사에 비해 수익을 세율이 낮은 국가로 옮기는 것이 훨씬 쉽다는 얘기다.
실제 S&P500 지수에 편입돼 있는 71개 IT 기업이 지난 2년 동안 낸 세금은 나머지 기업이 낸 세금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애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지난해 세전이익(342억달러) 대비 법인세 납부액(33억달러) 비율이 9.8%로 월마트(24.4%)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NYT는 24.4%는 보통 기업들의 평균적인 세금 납부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절세는 주주들을 위한 서비스”
비판론자들은 애플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고 있지만 이는 일반 국민들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특히 애플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IT 기업들의 막대한 수익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올해에만 92억달러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건강보험 혜택이나 주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줄여야 하는 처지다.
하지만 애플 관계자들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모두 절세를 하는 상황에서 애플만 비난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만약 애플이 자발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다면 이는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뉴욕=유창재 특파원 yoocool@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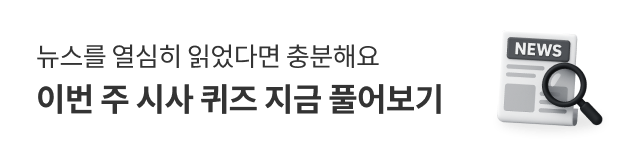
![[속보] APEC정상회의 건배주 '호랑이 유자 생막걸리'로 결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510/02.22579247.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