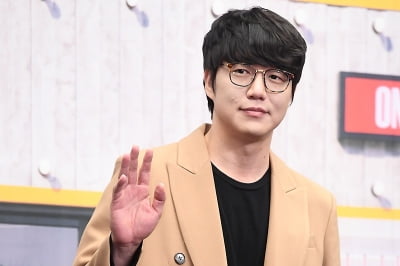농업부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투자효율성 문제로 파문이 크게 일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적 투자에 대해서는 그 효율성을
검증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노력이 당연히 경주돼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성 논의가 농업부문 투자를 삭감하려는 움직임과
연계될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지난 30년간 효율실현을 내걸고 공업화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을 추구해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간 차별적인 개발재원 배분을 비롯한 시장개입적
시책을 계속해 왔다.
예컨대 국내 총생산액에 대한 농업부문의 비중(기여도)이 20~30%였던
70년대중 농업부문 예산액의 크기는 전체 예산액의 5~6%수준에 그쳐왔다.
또한 지난 20년간(1971~90)산업생산액에 대한 산업부문 예산액의 크기는
21%였다.
이는 농업부문의 평균 6%의 3배가 되는 수치다.
이 과정에서 농업부문의 급속한 위축은 불가피해졌다.
전체 산업생산액 중에서 농업생산액의 비중이 40%에서 7%로 줄어든데
소요된 기간은 우리나라의 경우 28년(1964~93)이 걸렸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165년, 덴마크 199년, 영국 113년, 미국 96년, 독일
92년, 일본 73년 등 우리보다 3~6배나 긴 기간이 소요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급속히 위축된 국내농업은 90년대 들어서 개방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농발대책에 의한 42조원과 농특세에
의한 15조원 등 농업투자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과거의 차별적인 투융자정책이 없었던들, 오늘날 우리사회는 이러한
사회적 부담을 지지 않았어도 됐을 것이란 점부터 통찰할수 있어야 한다.
왜 우리는 농업부문에 대한 천문학적인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농업생산이 농산물이란 상품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식량안보다
국토와 환경보전 그리고 농촌 지역사회 유지 등 효율의 크기로 반영되지
않는 공익적인 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국내 농업이 위축되는 만큼 해외농산물을 수입할수는 있겠지만 국민이
원하는 품질의 먹거리를 적절한 값에 안전하게 공급할수 있는 식량안보
능력은 어디에서 수입할 것인가.
이미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국민 네사람 중에서 겨우 한사람 몫만을
자급할 정도로 크게 떨어지고 있지 아니한가.
홍수를 예방하고 대기를 정화하며,지역사회를 유지하는 등의 기능이
위축됨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지게 될 추가적인 부담은 또 어쩌란 것인가.
전체 산업생산액에서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3% 수준에 불과한
선진국들이 전체 예산액 중에서 5~10%의 높은 농정예산 배분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시장가격으로 평가되는 농산물 생산액의 크기보다 훨씬 큰
농업생산의 공공재(Public Goods)적 생산기능의 유지를 중시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뒤늦게나마 시작한 농업부문 투자를 효율성 시비와 연계하여
삭감하겠다는 정책선택은,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로 하여금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도록 전가시키겠다는 선택에 다름 아님을 깊이 통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정부간섭을 줄이면서 경제운용을
민간기능에 가능한 위임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저효율.고비용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개발연대 동안 계속되어 온 "큰 정부"체제를 "작은 정부"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는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민간부분이 참여하길 꺼리는 공공성이
큰 부문에 대한 정책마저 획일적으로 줄이겠다는 발상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의 시장개입이 축소, 중단될 경우 적절한 규모로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표적인 분야는 국방이나 교육 그리고 농업부문이다.
이 때문에 "작은 정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선진국들도 이 부문들에
대해서는 정책개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규모만큼
농업생산이 실현되지 않을 때, 우리 사회는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가서도
계속적으로 사회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음을 통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농업은 지난 경제개발 당시 농정의 빈곤으로 급속히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어 왔다.
사막처럼 황폐화된 땅에 겨우 몇년간 물 좀 대주었다고 새삼스럽게 투자의
효율성을 따질 처지는 아니다.
짧은 기간동안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 부분도 없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선택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8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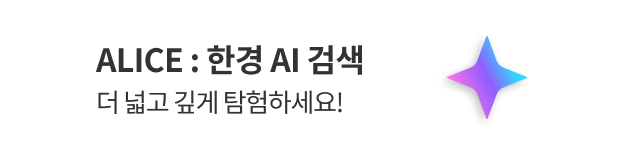

![[토요칼럼] 트럼프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7.2361746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