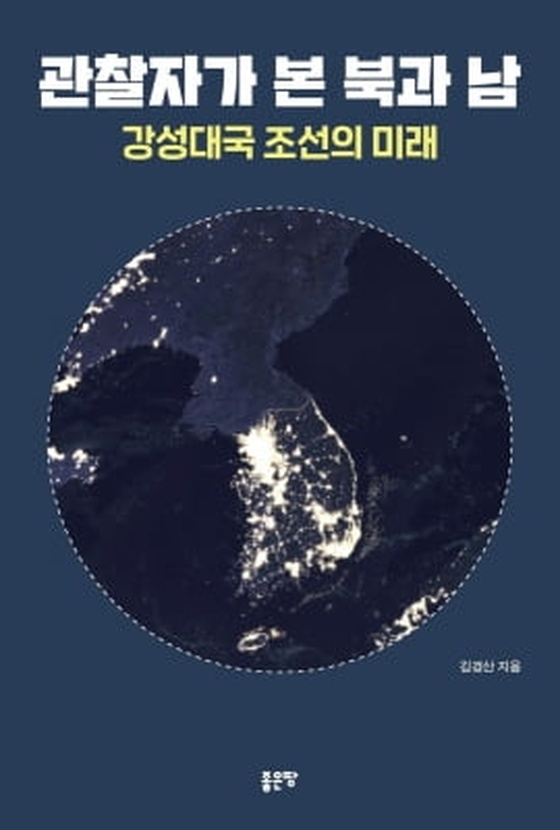[정규재 칼럼] 중앙은행장들의 슬픔
인플레 없다는 것도 변명에 불과
돈 풀수록 빈부 양극화만 커져…
정규재 논설위원실장 jkj@hankyung.com
![[정규재 칼럼] 중앙은행장들의 슬픔](https://img.hankyung.com/photo/201406/02.6926659.1.jpg)
재닛 옐런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도 “금리를 조금씩 올려갈 계획이라는 사실을 투자자들이 과소평가한다”며 거듭 환기해야 할 정도다. 초조한 것은 오히려 당국이다. 경제는 이미 넘치는 돈에 중독돼 있다. 언제고 돈이 모자라 경제가 돌지 않았던 적은 없다. 비전통적 정책이라는 말은 사실 금리정책의 실패를 은폐하는 레토릭이다. 양적완화라는 것은 알고 보면 변형된 재정정책에 불과하다. 중립적이어야 할 통화정책을 정치로 바꿔친 것이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다. 미국은 더욱 그렇다. Fed가 양적완화로 사들인 국공채는 모두 4조3500억달러다.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경제가 아니라 연방정부다. Fed가 역(逆)레포 금리를 금리 대체 수단으로 고려한다는 것도 실은 양적완화를 존속시키려는 꼼수다. 총 18조달러에 이르는 국가부채는 Fed 없이는 바로 디폴트다. Fed도 이미 미국 정부라는 거대한 채무자에게 코가 꿰이고 말았다. 역시 대마는 불사다. 독일의 쇼블레 재무장관이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에 반대하는 것은 미국과 달리 독일 재정이 그나마 건전하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은 원래 국가기구요 정치기구였다. 그러니 한은 독립 같은 말은 부디 잊으시라.
장기인플레이션이나 장기실업률에 대한 논쟁들은 구름 속을 더듬고 다닌다. 오바마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앨런 크루거는 이자를 낮춘다고 장기실업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Fed의 양대 정책 목표 중 나머지 하나(실업률 관리)까지 조롱하고 말았다. 시장은 이미 금리 아닌 조세정책이 실업 문제 핸들링에 더욱 효과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인플레이션 논란도 마찬가지다. 돈을 아무리 풀어도 그것에 비례해 통화속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인플레를 촉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당연한 이야기다. 지금 ECB가 상업은행들의 중앙은행 예치금에 벌금(마이너스 금리)을 물리겠다는 것은 돈이 실물로 가지 않고 모두 중앙은행으로 되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현상 같지만 저금리 상황에서 또렷이 드러났을 뿐이다.
유럽과 달리 미국에서는 풀린 돈이 주식과 부동산으로만 흐른다. 토마 피케티가 양극화 주범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자산 목록들 말이다. 그리고 자산거품은 보편적 물가상승만큼이나 빈부격차를 만들어 낸다. 주가가 사상최고로 폭등한 것은 빈부 양극화가 그만큼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좌에 불과하다. 자산가치를 끌어올리면 부는 필시 한쪽으로 흘러간다. 월가는 환호성을 내지른다. 그렇다면 Fed는 미국 경제의 후원자가 아니라 증권시장의 수호신이다. 그리고 ‘보편적’이 아니라 ‘계급적’이다. 서머스냐 옐런이냐는 투쟁이 바로 그런 선택의 싸움이었다. 월가는 후자를 택했고….
Fed 사람들에게는 항상 적절한 품위와 약간의 거들먹거림이 묻어난다. 위선은 필수품이다. 지금에 와서 알려진 것이지만 1990년대의 신경제라는 것도 Fed와는 거의 상관이 없었던 거다. 정보기술(IT)벤처이거나 월마트의 혁신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신경제였다. Fed는 사실 한 일이 별로 없다. 인간의 행동과 선택에 간섭하는 소위 사회과학적 예측의 불가능성을 명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칼 포퍼의 선례를 따라 ‘오이디푸스 효과’라고 부른다. 올가을 부동산 폭등이 확실히 예상된다면 부동산은 이미 여름에 폭등해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예측력은 이렇게 이론적으로도 부정된다. 지금 중앙은행은 증권 투기꾼들에게만 위세를 부린다. 그들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정규재 논설위원실장 jkj@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한경에세이] 허드슨야드에서 배우지 말아야 할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36586123.3.jpg)
![[데스크 칼럼] 'PF 정상화 방안' 작동 조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18256415.3.jpg)
![[조일훈 칼럼] 푸틴 등에 업은 김정은의 '남조선 완정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35383340.3.jpg)

!['매파 의사록'에 얼어붙은 투심…엔비디아 1000달러 돌파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ZA.36589088.1.jpg)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