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10㎞간격 분석…날씨 더 정확하게
지구 전역 기상정보 모아 슈퍼 컴퓨터로 분석·예측
한반도 최적화 예보 가능…2019년 모델 완성 목표
졸업논문 쓰다 관심생겨
기상청 들락거리며 공부…공군·美기상청 모델 개발

지난 23일 서울 신대방동 사무실에서 만난 홍성유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단장(사진)은 “영국 모델은 세계 1, 2위를 다투는 우수한 모델이지만 우리가 직접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10년 넘게 썼던 일본 모델도 도입 당시엔 최신 모델이었지만 업데이트가 안 되면서 점점 예측 능력이 떨어졌다. 2011년 2월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단이 출범한 이유다.
2019년까지 946억원을 들여 한국 지형에 적합한 수치예보모델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 2020년에는 세계 5위권 기상예측 선도국가로 올라선다는 계획이다. 홍 단장은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지난 3월 제2대 사업단장으로 취임했다.
○날씨 예측은 수학의 영역
수치예보모델은 지구에서 관측되는 기상 자료를 대기 방정식에 집어넣고 슈퍼컴퓨터로 돌려 몇 시간 뒤부터 며칠 뒤의 날씨까지 알려주는 모델을 말한다.
홍 단장은 “TV 뉴스에서 구름이 한반도를 덮고 있는 위성 사진을 보여주면서 날씨를 설명하다 보니 일반인은 이런 사진 몇 장으로 날씨를 예측한다고 오해한다”며 “위성사진으론 불과 세 시간 뒤의 날씨밖에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기압배치도를 상황별로 분류해놓고 이럴 경우엔 동해안에 비가 많이 오더라는 식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지금은 전적으로 수치예보모델에 의존하고 있다. 홍 단장은 “기상청에서 매일 오후 발표하는 다음날 날씨 예보는 아침에 입력한 기상데이터를 슈퍼컴퓨터가 6시간 동안 계산해 내놓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사업단이 개발하는 모델은 지구를 가로세로 10㎞씩 격자로 나눈 뒤 그 구역의 기상 데이터를 방정식에 넣고 풀어 한반도에는 어떤 날씨가 나타날지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그는 “유럽의 공기가 1주일 뒤면 한국에 도착한다”며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상 현상들이 복잡하게 상호 작용을 하면서 날씨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한국 날씨를 알려면 지구를 대상으로 한 모델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부 논문에서 시작된 관심
홍 단장이 수치예보모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대학 4학년(서울대 지구과학교육학과) 때였다.
학부 논문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이곳저곳 땅속 온도를 재고 다녔다. 힘만 들고 속도는 더뎠다. “깊이에 따른 땅속 온도를 수치로 예측할 수 있으면 훨씬 수월할 텐데….” 홍 단장이 수치모델 분야에 뛰어들게 된 계기다.
그는 “24시간 관측하고 방정식을 세워서 풀어봤는데 예측치가 틀리게 나타났다”며 “왜 틀릴까,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다 결국 석사와 박사 학위까지 수치예보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만 해도 한국에 수치예보모델을 연구하는 사람이 없었다. 홍 단장이 거의 혼자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석사 논문이 기상청의 날씨 예보에 활용되면서 그는 학생 때부터 기상청을 자주 들락거렸다.
그는 미국 기상청에도 7년간 근무했고 수치예보모델 개발에도 참여했다. 2012년에는 한국 공군의 의뢰를 받아 순수 국내 기술로 수치예보모델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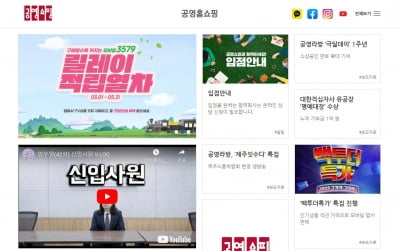


![3대지수 실적시즌 기대에 상승…테슬라 15%대 급등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6673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