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부업에 빠져 핵심 수익모델은 '뒷전'
달콤한 용역사업의 유혹
운영자금 대려고 외주업무, 경쟁사들 사업기회 선점
창업 목적 잊지 마라
단계적 자금계획 짜고 창업…어려워도 핵심사업 키워야

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잠깐 한다는 생각에 휴대폰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용역을 대기업으로부터 받았다. 발주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본업과는 동떨어진 ‘부업’을 3년이나 하게 됐다.
◆돈 된다고 함부로 달려들면…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외주를 따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 회사의 정체성이 모호해지자 이에 실망을 느낀 핵심 인력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원래 하려고 했던 서비스 개발은 더욱 어려워졌다. 아차 싶었을 때는 이미 회사의 중심이 서비스 개발보다는 용역업무에 맞춰져 있었다.
결국 이 회사의 대표 N씨는 지난해 여름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절대 용역 사업은 안 합니다. 힘들고 고생스럽더라도 처음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이번 시리즈를 위해 만나본 대부분의 벤처기업 사장들은 “사업 초창기 용역사업에 대한 유혹을 강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쉽기 때문이다. 당장의 현금유동성을 위해 섣불리 용역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주객이 전도된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물론 ‘부업’을 무조건 금기시할 수는 없다. 자금사정이 어려우면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다. 매출 1조원대의 국내 최대 게임업체로 성장한 넥슨도 1990년대 중반까지는 대기업 홈페이지 외주 제작 업무를 하면서 운영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넥슨 같은 성공사례는 드물다. 본업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어느새 경쟁사들이 나타나 사업 기회를 선점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의 존재 이유 고민해야”
1999년 국내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 프리챌을 창업했고 2011년 동영상 플랫폼 짱라이브를 만든 전제완 유아짱 사장은 “단기적인 돈벌이에 연연해 용역사업을 하는 이유는 대개 자금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창업했기 때문”이라며 “해당 시장 규모와 발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단계적인 자금 계획을 짜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 안착에 성공한 벤처기업인들은 초기에 일찌감치 핵심으로 치고 들어가지 못할 경우 장기적인 수익모델을 만드는 것도 어려워진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국내 게임 중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 기반을 갖고 있는 ‘트레인시티’ 개발사 라이포인터랙티브의 임정민 대표는 “회사의 존재 이유와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지 등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수단을 정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외주사업 금지’라는 원칙을 세우고 사업을 시작하는 벤처기업인들도 있다. 음악 기반 SNS 미로니 개발사인 제이제이에스미디어의 이재석 대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대표는 “‘절대 용역사업은 안 한다’는 원칙을 공개하고 같이 창업할 사람을 모았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력을 다해 핵심사업을 키우는 게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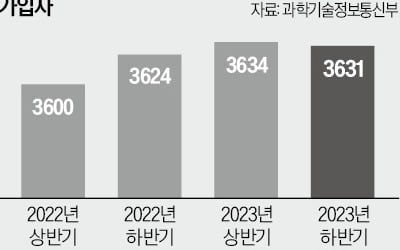



!["버핏, 애플 팔고 '9조' 베팅한 곳이…" 6개월 만에 깜짝 공개 [대가들의 포트폴리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29398.1.jpg)








![최강창민 '늦바람' 들게 한 '벤자민 버튼'…"삶 아름답게 정의해드립니다" [종합]](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ZA.3673518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