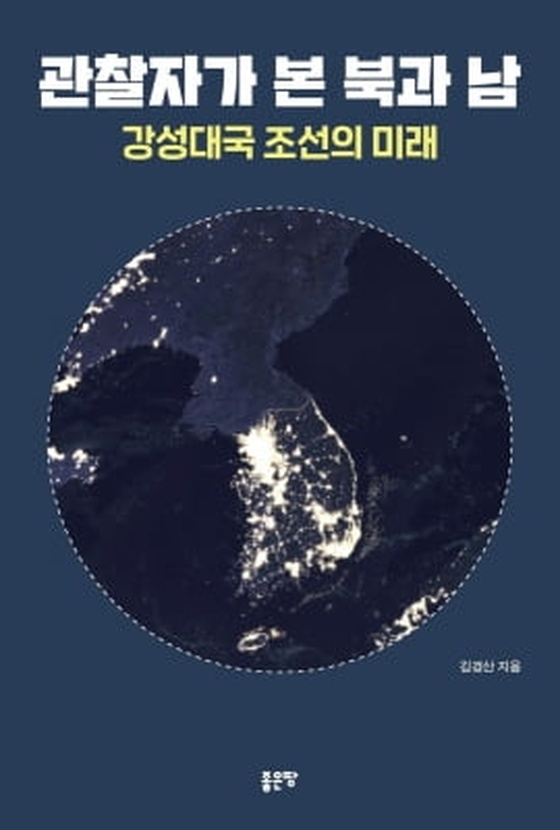[취재여록] 생존이 사업계획
중견 주택건설업체인 A사 관계자는 2009년도 계획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느냐는 기자 질문에 말꼬리를 흐렸다. 그저 답답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건설업체들은 해마다 11월쯤 다음 해 '마스터 플랜'을 발표해 왔다.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고 총 공급 규모는 얼마나 될 것이라고 미리 알렸던 것.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중견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대형 건설업체조차 내년도 계획을 확정하는 데 머뭇거리고 있다. 대형 B건설사 관계자는 이달 말이나 돼야 가능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국내외 변수까지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한 해 계획을 세우려면 경기변동을 가늠할 수 있는 예상 경제지표가 필요한데 제 때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 지표가 나와도 신뢰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한마디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사업계획 무용론'까지 등장했다. 뜻대로 되지도 않을 계획을 뭐하러 만드냐는 것이다. 사업성과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을 벌릴수록 손해라는 인식도 사업계획 확정을 미루게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주택업체들이 마련 중인 내년 공급 스케줄에는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말고는 자체 개발한 신규 아파트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건설업계가 생존 위기에 내몰리면서 '일단 살고보자'를 내년 목표로 정한 회사도 있다. 대형 건설업체 C사의 한 임원은 내부 회의에서 "우리의 목표는 끝까지 생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문제는 주택건설업계 사정을 '강건너 불'인 양 생각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내년에 어떤 아파트가 나올지 모른다면 수요자도 내집마련 계획을 짜지 못하게 돼서다. 내년에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모두에게 '안개 속'일 것이라는 건설업계의 걱정이 예사롭지 않다.
박종서 건설부동산부 기자cosmo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한경에세이] 허드슨야드에서 배우지 말아야 할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36586123.3.jpg)
![[데스크 칼럼] 'PF 정상화 방안' 작동 조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18256415.3.jpg)
![[조일훈 칼럼] 푸틴 등에 업은 김정은의 '남조선 완정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35383340.3.jpg)

!['매파 의사록'에 얼어붙은 투심…엔비디아 1000달러 돌파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ZA.36589088.1.jpg)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