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 하락기엔 '백약이 무효?'
시행때까지 시간차… 시장 반응 늦어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집값 하락세는 멈출 조짐이 안보인다. 때문에 돈을 빌려 집을 마련한 사람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는데도 집값은 왜 반응이 없을까. 집값은 단순히 정부대책에 좌우되기보다 경기흐름과 심리에 더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집값이 뛸 때는 너도나도 오를 것으로 보고 돈을 빌려 산다. 반대로 하락기엔 금리 이상의 가격상승을 기대하지 않으면 매수를 포기한다. 지금처럼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금리상승,주택공급과잉 등 하락 요인이 국내외에서 겹쳤을 때는 매수심리가 빙산처럼 얼어붙어 꿈쩍하지 않는다.
새 정부는 출범 1년도 안돼 모두 8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이 중 큰 대책만 3번에 이른다. 지난 9월에는 양도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9.1대책'을 선보였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6억원 초과 9억원 미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가 골자였다. 9월19일엔 보금자리주택 보급,그린벨트 해제를 담은 '서민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내놨다. 세 부담 완화와 공급확대를 섞은 대책이었지만 공급확대 우려에 9월 서울 집값은 전달보다 0.19% 빠졌다.
앞서 '6.11 지방 미분양 해소대책'에도 6월 전국 미분양 주택이 전달보다 1만9060가구 늘어 14만7230가구를 기록했다.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재건축 규제 완화,신도시 2곳 추가 건설 등을 담은 '8.21대책'에도 8,9월 강남 집값은 전달대비 0.35%,0.39% 하락했다.
더욱이 정부 대책은 시행되기까지 법적 절차가 필요해 시장에 반영되려면 보통 6개월∼1년간의 '시간차(타임래그)'가 생긴다. 이 같은 시간차는 하락기뿐 아니라 대세 상승기에도 똑같이 나타난다.
예컨대 참여정부 시절 '8·31대책'을 비롯해 10여 차례의 강도 높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밀어붙였지만 집값은 '반짝' 내리는 시늉만 하고 오름세를 유지했다. 결국 지난해 초 거시경제가 위축되고,주택공급이 과잉상태를 보이자 하락세로 돌아섰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엔비디아 이을 "숨은 AI 수혜주"…월가 47% 더 오를 것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2507272374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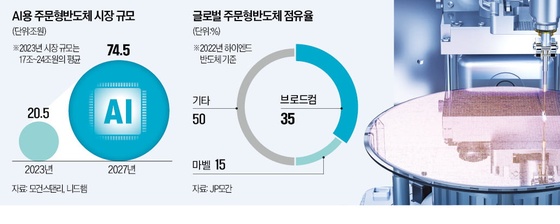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