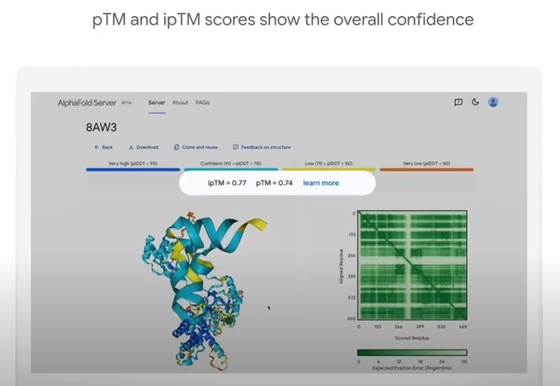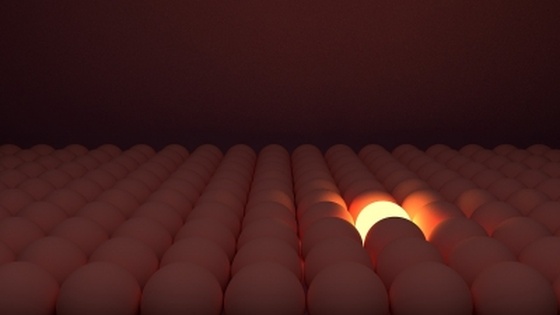[특파원 칼럼] 코로나 재난지원금 유감
![[특파원 칼럼] 코로나 재난지원금 유감](https://img.hankyung.com/photo/202005/07.18068892.1.jpg)
한국에서 정부 부처를 출입할 때 쓸모없는 사업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걸 보고 ‘차라리 그 돈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게 효용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이번 재난지원금 제도엔 유감이다. 우선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을 준다. 기자는 아이 셋인 5인 가구다. 1인 가구는 1인당 40만원을 받지만, 5인 가구는 그 절반인 20만원꼴을 받게 된다. 자녀가 더 많거나 부모를 모시고 산다면 1인당 금액은 더 줄어든다.
출산 장려하는 나라 맞나
액수를 떠나 이게 저출산 대책에 3년간 세금 117조원을 퍼부어온 나라의 기본 인식이란 점이 서글프다. 게다가 사용처도 제한해 쓰려면 ‘암호풀이’를 해야 할 판이고, 초기엔 신청할 때 기부를 유도한 통에 의도하지 않게 기부한 이들도 생겨났다. 미국엔 없는 일이다. 이런 시기에 힘들지 않은 이가 누가 있겠는가.
다시 저출산 얘기로 돌아가겠다. 2008년 셋째가 태어난 뒤 다자녀가구에 교육비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알아본 적이 있다.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의 100%에 해당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일 때다. 5인 가구 기준 월소득 약 500만원이면 대상이라는 뉴스를 보고 주민센터에 갔더니 직원이 “차가 있느냐”며 배기량부터 물었다. 셋째 출산을 앞두고 몇 개월 전 5명이 탈 수 있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장만한 터라 “2000㏄”라고 했더니 고개를 저었다. 따져보니 소득 기준은 실제 월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었다. 근로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이다. 2000㏄ 차량은 약 월 200만원으로 간주됐다. 공시가 2억원 상당이던 집도 그랬다. 결국 근로소득으로 월 100만원 넘게 벌면 불가능했다. 차도 집도 없고 아이들만 가득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 같았다. 이후 그런 혜택을 받으려 해본 적이 없다. 한국에서 아이 셋 아빠로 살기엔 여러모로 힘들다. 식당에서 밥먹을 때 “동메달, 목메달”하며 참견하는 사람도 여러 번 만났다. 아내는 일부러 외식을 삼갔다.
출산도, 이민도 쉽지 않은 한국
뉴욕특파원으로 지난 3년간 미국에 살면서 좋았던 건 다자녀 가구가 대우받는다는 점이다. 주립·국립공원에선 어른 3명(16세 미만 어린이는 무료)까지 한 가구가 연간패스 한 장으로 입장할 수 있다. 상당수 박물관과 동물원, 일부 테마파크에서도 한 가족 5~6인까지 패밀리 요금을 받는다. 통상 서너 명 표값 수준이다. 밥먹을 때 다가와 “애가 셋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다.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데다 다자녀 가구가 흔해서다.
미국도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 해 약 400만 명이 태어나고 있고, 이민까지 더해 인구는 증가 추세다. 동네에도 뒷집은 러시안, 옆집은 유대인, 그리고 앞집엔 중국인이 산다. 예멘 난민이 몰려온다거나 이자스민, 태영호가 국회의원이 되면 난리가 나는 한국과는 다르다.
기자는 1971년생이다. 그해 한국에선 사상 최다인 약 110만 명이 태어났다. 올해 신생아 수는 20만 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재난지원금 제도를 보면서 이런 추세를 뒤집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realist@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특파원 칼럼] 일본이 방역에 실패한 이유](https://img.hankyung.com/photo/202005/07.19613731.3.jpg)
![[특파원 칼럼] 트럼프 지지율이 말하는 세 가지](https://img.hankyung.com/photo/202004/07.14477123.3.jpg)


![화웨이에 반도체 수출금지 '직격탄'...인텔 2.2% 급락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090647304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