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은 김포 집값에…남모르게 웃음 짓는 곳이? [집코노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시세 단기 급등에 낙찰가율 고공행진
빚 못 받을 뻔했던 채권자는 함박웃음
빚 못 받을 뻔했던 채권자는 함박웃음

23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진행된 김포 장기동 ‘한강센트럴자이1단지’ 전용면적 84㎡ 입찰에 81명의 투자자가 몰렸다. 올 하반기 진행된 경매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했던 건 경매개시 시점과 입찰기일 시점의 가격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경매개시와 함께 결정된 이 주택형의 감정가격은 3억9100만원이다. 감정가격은 경매에서 입찰 하한선을 의미한다. 그러나 입찰기일까지 몇 달 새 김포 집값이 급등하면서 같은 주택형의 실거래가는 이달 중순 6억1800만원까지 올랐다. 시세는 7억을 호가한다.
최저입찰가와 시세의 간극이 큰 탓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판돈’도 커졌다. 감정가의 10%씩 내야하는 입찰보증금만 이날 하루 31억6000만원이 몰렸다. 낙찰은 경합이 벌어졌다. 낙찰자(6억1021만원)와 차순위 입찰자(6억500만원)의 격차가 500만원에 불과했다.
당초 경매업계에선 낙찰자가 앉아서 1억원에 가까운 차익을 쥐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장 시세대로 되팔기만 해도 9000만원의 웃돈을 받을 수 있어서다. 그러나 매각허가일인 24일을 코앞에 두고 지난 20일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경매업계 관계자는 “김포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라면 이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가 발생한다”며 “규제를 받으면서 시장 상황이 급변해 가격이 유지될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경매에서 낙찰을 포기하려면 매각불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매각불허가는 법원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진 뒤 결정하는 것이어서 낙찰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지 않다. 이 때문에 통상 낙찰자가 입찰 당시 냈던 보증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경매를 물린다. 하지만 낙찰자가 낙찰을 포기하면 4000만원을 허공이 날리는 셈이다. 이 때문에 경매업계에선 낙찰자가 매각허가 이후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남모르게 웃음짓는 건 후순위 채권자다. 이 경매의 배당 우선순위는 주택금융공사와 A저축은행, 서울보증보험, B은행 등이다. 낙찰가에서 이 순서대로 채권을 회수한다는 의미다. 감정가격인 3억9100만원 수준에서 낙찰이 이뤄졌다면 합산 채권이 4억원대인 1~3순위만 배당받고 경매가 마무리된다. 4순위인 B은행은 3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셈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6억원대 낙찰이 이뤄지면서 B은행 또한 채권 가운데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경매가 개시될 때만 해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채권이 ‘잭팟’으로 돌아온 것이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실무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웃지 못할 일”이라며 “‘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던 김포에서 집값이 단기 급등하며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건 그만큼 정책이 재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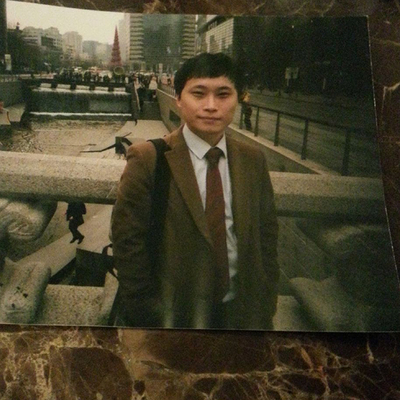

![하버드대 부동산 박사가 말하는 강북 유망 투자처는? [집코노미TV]](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1.24482798.3.jpg)
![제2의 김포 찾기…추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엇갈린 '희비' [집코노미TV]](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1.24483169.3.jpg)
![당신도 수도권 신축 아파트 입성할 수 있습니다 [집터뷰 2.0]](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1.24482357.3.jpg)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