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조차 못해…규제 '첩첩산중'

특정금전신탁에서도 원하는 재산을 모두 맡기기는 어렵다. 재산 범위를 제한해 놨기 때문이다. 은행이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은 금전·증권·부동산 등 규정된 일곱 가지 항목뿐이다. 영업·담보권·부채·보험금 청구권 등은 고객이 원해도 맡길 수 없다.
광고와 홍보를 금지한 것도 신탁시장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규제다. 신탁 상품은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홍보를 할 수 없다. 대면 영업 채널을 통하지 않고서는 상품을 알리기가 어렵다. 한 은행의 신탁사업부문 관계자는 “비슷한 구조로 설계해도 펀드는 홍보가 가능하고 신탁은 구경만 해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투자자에게 알음알음 파는 수밖에 없어 시장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은행 신탁시장 규모는 40조원 수준에서 정체된 상태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간담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저금리·고령화 사회에서 신탁은 중요한 자산 증식 수단인데 오히려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송영찬/정소람 기자 0full@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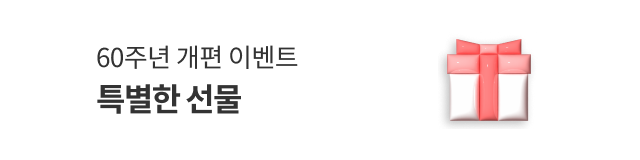



![[단독] "한국만 골든타임 놓쳤다"…'10조 사업' 날린 이유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AA.38671929.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