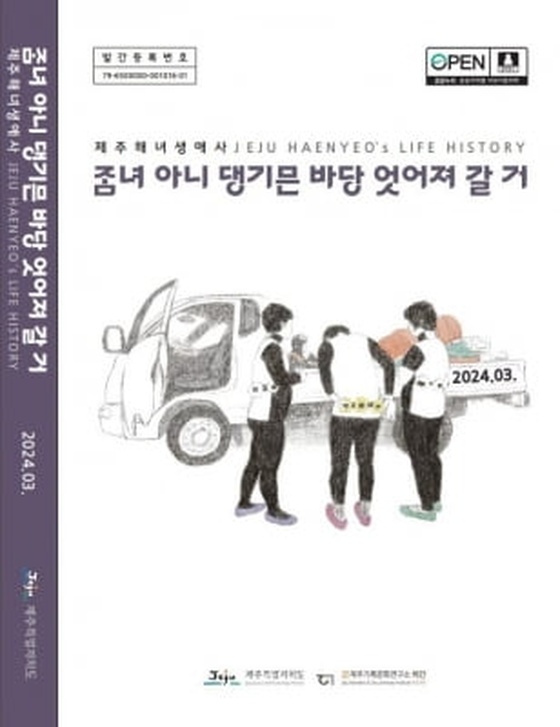[시론] 소비자 외면하는 유통규제 철폐해야
국민후생은커녕 불편만 강요할 뿐
경쟁원리 바탕에서 협력 작동해야"
최영홍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유통법학회장 >
![[시론] 소비자 외면하는 유통규제 철폐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1502/AA.9610097.1.jpg)
그러나 명분에서 느껴지는 의로움과는 달리 경제민주화가 실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됐는지는 의문이다. 아무리 화려한 명분이라도 실질이 없으면 공허하다. 국민은 이런 점을,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간파해낸다. 최근 들어 경제민주화의 열기가 급격히 약화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왜 이렇게 됐는가. 그것은 경제민주화의 법제화 과정에 내포된 무분별성과 기본적 원리를 무시하는 난폭성 때문일 것이다.
경제민주화 입법 중 일부는 합리적 규제의 한계를 벗어났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유통분야에서 그렇다. 모든 유통의 흐름에는 반드시 소비자가 존재한다. 직구(直購)처럼 소매상 없는 유통은 존재할 수 있어도, 소비자 없는 유통은 존재할 수 없다. 골목주민이 골목상인보다 우선이듯 소비자가 상인보다 우선인 것이다. 소비자는 유통구조상의 용어일 뿐, 실제로는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이다. 우리 모두가 소비자다.
그런데 유통규제법 개정과정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이익은 고려되지 않았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상생법’이나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에 ‘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구는 빠져 있다. 유통의 중간단계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이해상충 문제에 매몰돼 정작 유통의 궁극적 지향점인 국민의 권익을 무시했다. 소비자의 복리증진 수단인 경쟁을 억제하면서 소비자 보호에는 눈감아버린 것이다.
그 결과 유통규제법은 국민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불편과 불이익을 강요하고 있다. 그럼에도 입법자는 국민에게 한마디 양해도 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의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의기양양해 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경제민주화에 민주는 없다. 생활정치는 더더욱 없다. 정치가 지향해야 할 국민을 보지 못하고 중간단계의 상인들만 바라보니 견지망월(見指忘月)이라고나 할까. 선진국 법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유통분야에서 전개되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압축적 경제성장 과정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반작용이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성장통일 수 있다. 이런 진통은 조기에 극복돼야 한다. 국가의 존립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이므로, 그에 반하는 법제는 시정돼야 한다. 계약자유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인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원리의 굳건한 바탕 위에 상생과 협력이라는 원리가 보완적으로 작동돼야 한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게 하되, 경쟁할 것은 치열하게 경쟁하게 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경쟁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까지 마구잡이로 상생을 요구하고, 그나마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에만 치중했다.
논의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대립구도를 벗어나, ‘기업 대 소비자’의 구도가 돼야 한다. ‘기업끼리의 상생’이 아니라 ‘국민과의 상생’이 기준이 돼야 한다. 기업은 규모를 떠나 오직 누가 더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래야만 무익하거나 유해한 정치인이 퇴출되듯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기업도 자연스럽게 퇴출된다. 입법자의 각성도 필요하다. 그들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지 특정 계층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다. 지지층에 대한 의리보다 국민에 대한 도리를 우선해야 한다.
최영홍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유통법학회장 yc478@korea.ac.kr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사람경영, 채용이 전부다 [한경에세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797936.3.jpg)
![[한경에세이] 허드슨야드에서 배우지 말아야 할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36586123.3.jpg)
![[데스크 칼럼] 'PF 정상화 방안' 작동 조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18256415.3.jpg)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