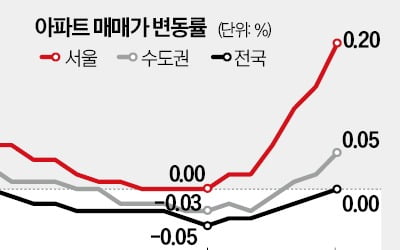'쌍용 워크아웃' 난항에 가슴 졸이는 건설업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동산 프리즘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의 재무 상황은 악화일로다. 지난 4월 삼정KPMG 등이 벌인 실사에서 쌍용건설 존속가치는 8227억원으로 청산가치(4318억원)의 두 배로 나와 워크아웃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는 이뤄졌지만 채권단의 지원 합의가 늦어진 탓이다.
쌍용건설은 이달 말 만기가 돌아오는 약 131억원의 전자어음을 막기에도 버거운 실정이다. 지난 3월부터 민간공사 발주처들이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으며 공공공사 대금은 하도급업체로 직접 지급되고 있다.
업계는 쌍용건설이 정상화에 실패하면 1400여개 협력업체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고 다른 건설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쌍용건설이 무너지면 업계 부실이 대형 건설사까지 번졌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져 위기가 업계 전반으로 번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외 사업도 타격이 예상된다. 최근 쌍용건설은 최근 중동의 한 대형 지하철 공사발주처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난감해하고 있다. 회사 측은 “현재로선 재무 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워크아웃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외 수주가 취소되고 낙찰 대상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쌍용건설이 입찰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예정인 총 8조원 규모의 대형 토목·건축 프로젝트의 수주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미 수주한 물량의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다.
금융권도 큰 손실을 볼 전망이다. 법정관리는 해외에서 파산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져 지급보증을 선 금융회사들이 약 3500억원의 채권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또 국내에서만 약 1조7000억원의 손실이 날 전망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