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브란스병원의 변화에 주목한다
이런 일은 선진국에서는 낯설지 않다. 미국이 자랑하는 연구중심대학들을 보면 거의 예외없이 부설 병원이 로열티 수입을 주도한다. 하버드대, 존스홉킨스대 등만 봐도 그렇다. 대학과 기업 간 기술중개 역할을 하는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도 병원이 주도한 것이다. 선진국에서 병원은 대학은 물론이고 국가 전체 연구개발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이다.
이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병원 관련 학회들을 잔뜩 만들어놨지만 정작 연구실적이 나와도 병원 안에 묻히기 일쑤다. 같은 대학 내에서 이공계 단과대학과 병원 간 교류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기초의학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진다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보다는 당장 우수한 인재들을 의대로 다 빼앗긴다며 이공계 대학의 불만만 팽배해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학 병원과 의사를 연구소와 연구인력으로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 세브란스병원이 바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의 변화는 이것만이 아니다. 현지병원 위탁경영 형태로 러시아에 진출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성사된다면 병원 수출이다. 상품만 수출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지난 3분기까지 서비스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만 봐도 그렇다. 서비스 중에서도 의료분야는 특히 유망하다. 현지진출로 한국의 뛰어난 의료기술과 병원 경영의 우수성을 보여주면 바로 국내 의료관광으로 이어질 게 틀림없다.
이런 변화가 더 많은 병원으로 확산돼야 한다. 정부는 병원을 국가연구시스템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규제도 없애야 한다. 병원과 기업을 잇고 수출까지 하려면 병원 투자의 길부터 터 줘야 할 것이다. 영리병원을 놓고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소모적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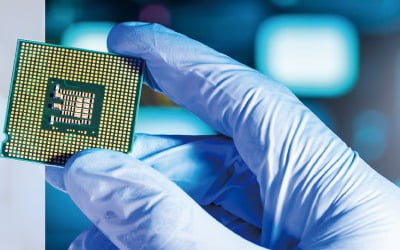
![[포토] 뽀로로와 삼성 세탁건조기 써봐요](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AA.36572959.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