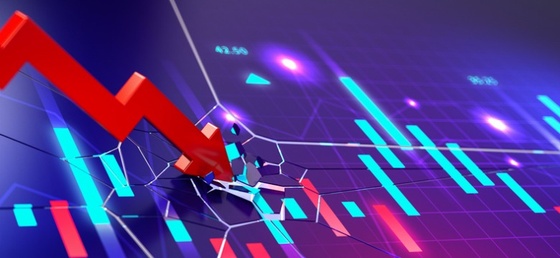감추는 이란 정부, 폭로하는 네티즌
NYT는 한때 이란은 장거리 전화와 외국인들의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나라 안 갈등을 숨길 수 있었지만 21세기에는 이 같은 방법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많은 국민이 카메라가 달린 휴대전화와 단문 메시지 송수신 서비스인 트위터의 계정을 갖게 되면서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 외부에 국내 문제를 알리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일 네다 아그하-솔탄(27)이라는 여성이 시위 도중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은 정부와 시위대간 인터넷 전쟁의 기폭제가 됐다.
아그하-솔탄이 죽어가는 장면을 찍은 한 남성은 국내 유튜브와 페이스북 접속이 차단된 점을 고려, 40초 남짓의 영상을 유럽의 온라인 친구 5명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이들 중에는 네덜란드로 망명한 이란인이 포함돼 있었고 그는 "세계가 알게 해달라"는 발신자의 부탁대로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영상은 유튜브에도 배포되면서 급속히 퍼져 나가 몇 시간 뒤 미 CNN 방송에 보도됐다.
외신기자의 근접 취재를 제한하는 등 이번 사태를 은밀히 덮으려던 이란 정부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 한편의 영상으로 인해 아그하-솔탄은 익명의 피해자에서 이란 저항운동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하버드대 버크만 인터넷.사회 연구소의 존 팰프리 공동 소장은 인터넷 보급이 이란 정부의 검열을 훨씬 더 복잡한 일거리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인터넷 접속을 느리게 하거나 최신 염탐기술을 이용해 반대세력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등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키아-지멘스 네트웍스로부터 전화내용을 감시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제한된 방식으로나마 트위터 등에 접속, 하루 수백 건씩 시위 관련 영상을 올리고 있다.
정부로서도 인터넷 접속을 완전히 차단할 경우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나비테지 딜론 애널리스트는 인터넷으로 인해 지난 30년간 무엇을 보여주고 보이지 말지 결정해 온 정부의 언론 통제방식을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eun@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속보] 중국 4월 소매판매 2.3% 증가…산업생산은 6.7% 늘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AD.2548178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