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 "홍사덕.서청원 네거티브 좌시못해"
"근거없는 음해성 폭로에는 적극 대처하겠다."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측이 4일 경선 라이벌인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측의 파상적 검증공세에 대해 무대응의 침묵을 깨고 응전의 `칼'을 빼들었다.
지난달 25일 당 지도부-대선주자 연석회의 직후 `무대응 기조'를 선언한 지 9일 만이다.
이 전 시장측은 "진흙탕 싸움에 휘말리지 않겠다"며 그동안 맞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박 전 대표측의 최근 주장이 금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서 적극 대응으로 기조를 선회했다.
특히 캠프 일각에선 `전재산 헌납설' 등을 제기한 박 전 대표 캠프의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과 `도곡동 땅' 발언을 한 서청원 상임고문에 대해서는 당의 조치를 지켜 본 뒤 미흡할 경우 캠프 차원에서 직접 검찰에 고발하자는 강경론까지 나와 주목된다.
이 전 시장측이 이처럼 강경대응 쪽으로 선회한 것은 박 전 대표 진영의 `이명박 흠집내기'를 마냥 방치할 경우 근거없는 `허위주장'이 `사실'로 굳어지면서 경선 승리에 차질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캠프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전 대표측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과 서청원 상임고문이 연일 허위폭로에 앞장서며 `반칙 경선'을 주도하고 있다.
홍 위원장의 경우는 `재산헌납은 헌정사상 최대의 매표행위' 운운하며 있지도 않은 소설을 쓰고 있다"면서 "허위폭로와 음해에 대해서는 후보 보호 차원에서 분명히 문제를 짚겠다.
반칙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 고문은) 비록 비리에 연루돼 탈당 선언을 하고 (홍 위원장은) 공천에 떨어져 탈당하는 등 당에 누를 끼쳤지만 당원들은 두 분이 이번 경선에서 원로로서의 역할을 해 주길 기대했다"면서 "자기 상품을 팔 생각은 안 하고 남의 상품을 흠집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불공정행위는 이제 그만두자"고 촉구했다.
캠프가 문제삼고 나선 발언은 "이 전 시장이 전 재산헌납 카드를 쓸 수 있다.
재산의 10분의 1도 안 내놓고 전부 내놓았다고 거짓말 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홍 위원장의 최근 발언과 "이 전 시장이 과거 도곡동 땅을 `내 땅'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서 고문의 전날 발언 등이다.
진수희 공동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홍 위원장과 서 고문 등 박 전 대표 캠프의 지도부가 앞장서 네거티브를 넘어선 음해성 주장을 늘어놓고 있는데 좌시할 수 없다"면서 "당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아침회의에서 당의 조치가 미흡하면 캠프 차원에서도 법적 대응을 하자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캠프는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 대응도 유도하는 분위기다.
이 전 시장의 친형과 처남 김재정씨가 소유한 `다스'가 이날 오후 박 전 대표측 인사들을 고소키로 한 것도 이런 차원으로 보인다.
다스는 김재정씨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도한 언론사와 이 보도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한 박 전 대표측 서청원 고문과 유승민 의원, 다스의 천호사거리 뉴타운 특혜의혹을 제기한 이혜훈 의원을 각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키로 했다.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캠프는 최근의 잇단 부동산 의혹 제기가 정권차원의 정치공작이라는 점을 알리는데도 주력했다.
캠프 좌장격인 이재오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노무현 정권'은 정치공작으로 등장한 정권으로, 정치공작을 통해 정권을 다시 (범여권에) 넘겨주려는 추악한 권력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정치공작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는 정치공작 태스크포스(TF)가 있다면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은 지금까지 숨겨놓은 야당후보 X-파일이 없다고 답변해 왔으나 어제 국회 정보위에선 국정원장이 X-파일 존재 여부에 대해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는 중대한 정치개입 시사 발언"이라면서 "국정원 스스로 한나라당 집권저지를 위한 정치공작의 일선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국정원장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프 소속 정두언 윤건영 진수희 의원은 이날 개인자료 유출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를 방문, 전산망 열람기록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sims@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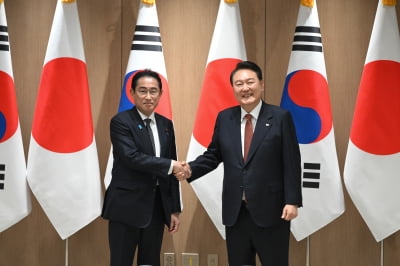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오늘의 arte] 티켓 이벤트 : 메가박스 '로열 발레: 백조의 호수'](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AA.3674549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