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4:38
수정2006.04.02 04:41
한국축구 차기 사령탑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브뤼노 메추(50) 감독의 한국행이 과연 성사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입 협상의 실무 책임자인 대한축구협회 가삼현 국제국장은 1일 메추를 대상자로 선정하기까지 과정과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가 국장은 외신을 통해 전해지는 메추의 반응 등을 볼때 "상황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든다"면서도 "협회에서 공식 제안서를 보낸 만큼 답신을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선정 과정= 협회는 4명으로 압축된 후보 중 1명을 대상자로 발표할 지 아니면내부적으로만 우선 순위를 정해놓고 협상에 들어갈 지를 놓고 고심하다 결국 전자를택했다.
가 국장은 "1명을 정하는 게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협상테이블에 끌어내는데 더낫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방식이 협상에서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지 검증단의 평가는 말 그대로 기술적인 평가였지 그 자체가 협상은아니었다며 현재 메추의 신분은 협상 대상자이지 대표팀 감독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즉 검증단이 지난 달 24일 현지에서 메추를 만났을 당시 호의적인 분위기가 오갔고 한국팀을 맡겠다는 의향을 충분히 듣기는 했지만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설명이다.
◆협상 어디까지 왔나= 메추와의 공식 협상은 31일 오후 제안서를 발송하면서시작됐고 그 문서를 검토하는 단계라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물론 검증단의 현지 접촉에서 한국에 온다면 언제부터 올 수 있고 언제까지 있기를 원하며 코칭 스태프는 누구를 데려오고 싶다는 등 세부 조건에 대해 상당부분조율을 마쳤다.
그러나 협상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연봉 문제는 아직 `백지상태'로 남아있다.
협회는 제안서에 구체적인 액수를 적시해 메추에게 보냈고 메추가 이를 보고 수정 제안을 해올 가능성도 남겨놓고 있다.
현 소속 팀인 UAE 알 아인이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카타르의 알 이티하드로부터한국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제시받은 메추로서는 `돈(클럽)이냐, 명예(대표팀)냐'를놓고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메추는 카타르 도하로 건너가 이티하드측과 접촉한 뒤 1일 두바이로 다시 돌아갔다.
◆메추의 의중은= 메추는 중동의 한 외신 인터뷰에서 "한국도, 카타르도 가지않겠다"고 말해 구구한 억측을 낳고 있다.
가 국장은 "현재 메추의 입장이 상당히 곤란해졌을 것 같다.
당초 알 아인과는계약을 해지할 때 미리 고지를 해주기로 했는데 언론에서 먼저 한국감독으로 확정된것처럼 보도가 나오니까 조심스러운 입장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행을 부인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은 결국 기존 구단에 대한 입장 때문이라는해석인 셈이다.
현지에서 또 메추가 `위약금 100만달러를 물어야 팀을 옮길 수 있다'는 보도가나온 데 대해 가 국장은 "위약금이 있는 지는 모르지만 본인 입으로 한국에 올 수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보자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메추가 몸값을 올리기 위해 갑자기 카타르에 다녀오는 등 일종의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진통' 누구의 책임인가= 축구협회는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기술위와 협상 실무진인 국제국이 `엇박자'를 내는 바람에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는 안팎의 비난을 받고 있다.
가 국장은 "기술위원회 쪽에서 `99% 얘기가 끝났고 빠르면 2일 터키전에도 벤치에 앉을 수 있다는 뉘앙스로 발표를 했다고 하지만 발표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연봉만 빼고 다 합의가 돼 1%만 남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돈문제가 남았으니까 99%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결국 국제적으로 한국축구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킬 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는 이번 사태는 협회의 미숙한 행정력과 안이한 대처가 빚은 합작품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축구계에서는 민감한 감독 영입 문제를 처리할 때일수록 치밀한 대처가 요구되는데 반해 국제국과 기술위가 결과적으로 손을 맞추지 못해 사태를 어렵게 몰고 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협회는 여기다 `언론에서 확정적으로 보도를 하는 바람에 일이 어려워졌다'는변명을 내놓기도 해 또다른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옥철기자 oakchul@yna.co.kr
!["고점 높은 DK, 서머 우승도 가능"…자신감 보인 쇼메이커 [이주현의 로그인 e스포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823290.3.jpg)

![[골프브리핑] 혼마골프, 신제품 베레스09 모델에 김태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818363.3.jpg)


![엔비디아 이을 "숨은 AI 수혜주"…월가 47% 더 오를 것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2507272374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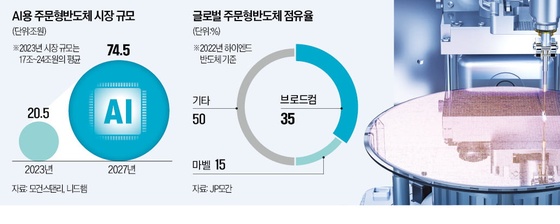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