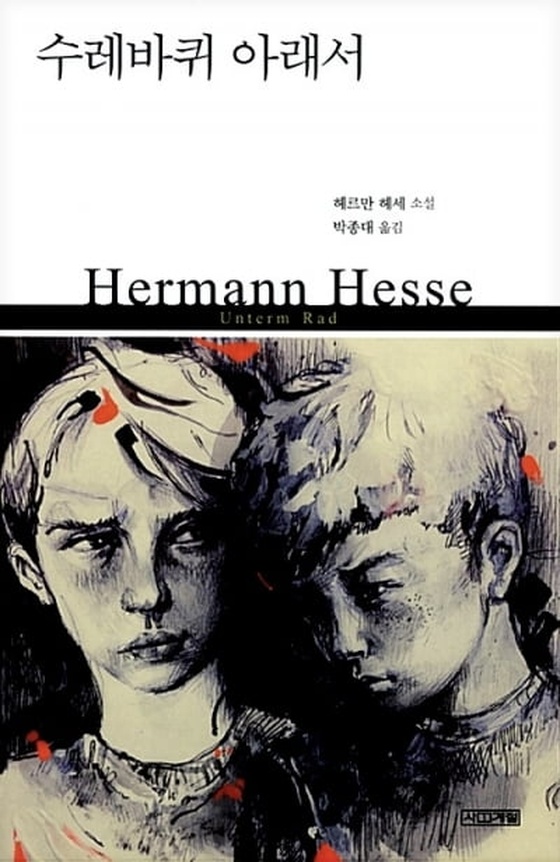입력2006.04.02 06:57
수정2006.04.02 07:01
"세계적인 IT(정보기술)산업 경기침체와 통신회사들의 경영난으로 순수 통신업체에만 지분을 매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18일 당초 해외 통신업체들한테 매각키로 했던 정부 보유 KT(한국통신)지분을 투자은행 등에도 매각하기로 방침을 바꿨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무적 투자유치'라는 생경한 용어를 사용했다.
외자유치면 외자유치지 '재무적 투자유치'는 또 무엇인가.
단기 투자차익만 챙기고 빠져나갈 수 있는 투자은행들에 공기업 지분을 매각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을까봐 고안해낸 조어(造語)란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재무적 투자유치'란 말까지 내놓아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정부로서는 내년초까지 KT 지분 10% 이상을 해외에 매각해야 이후 국내 매각의 물량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내년 6월말까지 KT를 완전 민영화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해외매각을 더이상 늦출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해외 투자은행들에도 지분 매입 자격을 주기로 했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한다.
내년 6월말까지 KT를 완전 민영화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인가.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상당한 돈이 외국 투자은행들 손에 넘어가는 한이 있어도 민영화 약속은 지켜야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내년초까지 정부 지분을 해외에 매각해야만 하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편익과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요즘 IT업계에서는 내년 2·4분기 이후 세계 IT경기가 살아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따라서 일정을 조금 늦춰 시장과 증시가 호전되는 시점에 완전 민영화를 추진해도 내년말까지 끝낼 수 있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그렇지 않고 이날 나온 계획처럼 성급하게 밀어붙이다간 외국 투자사들에 국민기업을 헐값에 팔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결국 여당과 정부가 KT 민영화를 치적으로 남기기 위해 외국 투자사들과 손잡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정부지분 해외매각 방식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장규호 IT부 기자 seinit@hankyung.com
![[한경에세이] 뾰족한 고성과 조직의 시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36609646.3.jpg)
![[토요칼럼] K팝 지배구조 민낯 드러낸 '민희진 신드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14616431.3.jpg)



![벅셔 주총장 팀쿡 등장…버핏은 애플 지분 13% 팔았다 [오마하 현장 리포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05014502147.jpg)

![[단독] 신협, 연체율 관리 총력…부실채권 투자社 설립](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AA.3655186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