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풀린 환율...날개단 물가] '원貨 얼마나 갈까'
엔화 약세에서 촉발된 원화 환율 급등이 최근 달러화 사재기로 이어질 조짐마저 엿보인다.
원화의 엔화 동조화 현상도 엔화 환율이 내려갈 때는 별로 반영되지 않다가 올라갈 때만 따라 오르는 ''상향 동조화''로 바뀌었다.
재경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도 이젠 전혀 약발이 안먹힌다.
29,30일 이틀간 원화환율이 30원 가까이 오른 것은 엔화 약세에다 불안심리가 더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은 관계자는 "환율이 더 오를 것이란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달러화 선취매 수요가 일었고 매도자는 뒤로 발을 빼 오름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보유 달러화는 더 움켜쥐고 필요한 달러화는 미리 사두려는 전형적인 ''리드&래그(Lead & Lag)'' 전략이 팽배하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은 올 상반기중 환율이 1천3백40원까지 오르고 하반기엔 1천2백60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 도이체방크는 지난 26일자 아시아 위클리 보고서에서 3개월 후 원화환율을 1천3백30원, 6개월 후 1천3백50원으로 예상했다.
외환시장에선 대체로 1천3백30원선에서 단기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저항선이 뚫리면 1천3백5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엔화가 현상유지한다면 1천3백10∼1천3백30원의 박스권을 맴돌 것으로 점치고 있다.
딜러들은 그동안 원화환율의 1천3백30원선 진입에 대해 ''너무 빨리 왔다''는 시각과 ''시장 기조는 오름세''라는 시각이 엇갈린다.
시중은행의 한 딜러는 "엔화 약세에 따른 동남아 통화의 전반적 약세를 감안할 때 엔화환율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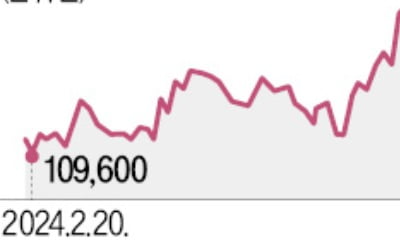



!["테일러 스위프트 남친도 팔았다"…세금 감면받을 권리 [김리안의 에네르기파WAR]](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4748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