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려면 공무원 氣도 살려라] '흠집내기 청문회'에 장관꿈 접는 공무원들
정치권 정략도구로 전락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전 능력 검증이라는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정치권의 정략 도구로 전락하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성취욕도 많이 꺾이고 있다. 당리당략에 따라 후보자 흠집 내기를 위한 엉뚱한 질문을 쏟아내는 것은 물론 도덕적 기준 역시 상황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후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도덕성 검증과 능력 검증을 구분해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현 인사청문회 제도에선 후보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무차별 검증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상 검증과 가족사 파헤치기, 재산 축적 과정 등 후보자와 주변인의 과거 일거수일투족이 공격 타깃이 된다. 2009년 9월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에선 느닷없이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큰아들의 씀씀이가 야당의 공격 대상이 됐다.
자격 검증을 이유로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자료 역시 무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컨대 지난 4년간의 골프장 출입기록과 동반자 명단, 경비 출처, 4촌 이내 친인척의 해외여행 기록 및 경비 출처 등 그야말로 ‘바닥 훑기’식 자료를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자녀 이혼, 배우자 암 수술 등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개인사까지 공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적용하는 모호한 잣대도 문제다. 똑같은 위장전입 문제로 2002년 장상 총리 후보자는 낙마했지만 2009년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기사회생했다. 논문 표절 의혹 역시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해당 후보자 간 희비가 엇갈리곤 했다.
인사청문회 개선은 정치권의 해묵은 숙제다. 정권마다 여당은 개선책을 내놓지만 인사청문회를 정부 견제 수단으로 삼는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말 공직 후보와 그 가족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 무력화를 중단하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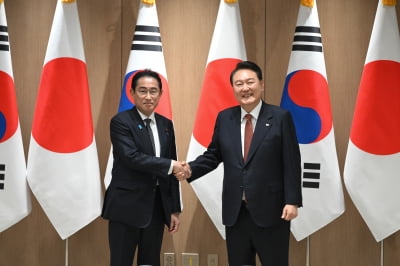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오늘의 arte] 티켓 이벤트 : 메가박스 '로열 발레: 백조의 호수'](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AA.3674549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