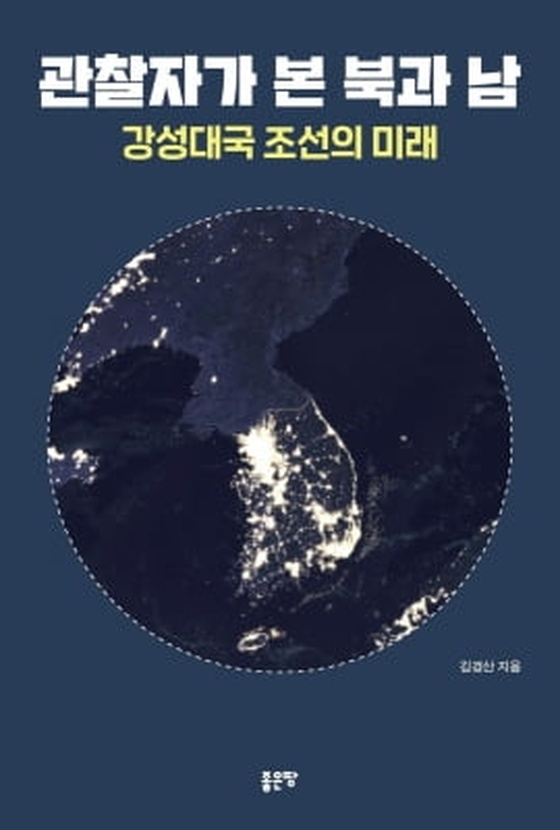[정규재 칼럼] 위기의 자영업(上) - 자부심은 사라지고
업종 지역 불문, 30%는 공급 과잉
어느새 정부보호 받는 존재로 전락
정규재 논설위원실장 jkj@hankyung.com
![[정규재 칼럼] 위기의 자영업(上) - 자부심은 사라지고](https://img.hankyung.com/photo/201410/02.6926659.1.jpg)
자영업은 곧 자부심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대처의 부친 알프레드 로버츠는 잡화점 주인이었다. 때문에 대처는 총리가 된 후에도 배추 한 포기, 삼겹살 한 근 값에 대해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었다. 미국 영화에 곧잘 등장하는 전형적 캐릭터에는 안경을 끼고 멜빵을 한 채 주판알을 퉁기는, 머리가 약간 벗겨진 중년의 사내들도 포함된다. 그들은 알 카포네가 출몰하는 거리에서도 간난을 이겨내는 자립의 표상이었다. 그랬기에 한국에서 이민간 분들이 첫 직업으로 꼭 거쳐 가는 것도 잡화점이다.
한국의 자영업은 그러나 자부심을 잃고 있다. 우선 자영업자 수가 너무 많다. 580만명이다. 취직도 못하고 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돕는 대졸 아들 딸을 합치면 711만명이다. 전체 취업자의 28%다. 줄어드는 듯싶던 자영업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1년에 근 90만명이 창업을 하고 그중 80만명이 폐업을 한다. 참혹한 경쟁이다. 그것도 해마다 증가세다. 작년엔 드디어 83만3000명이 가게 문을 닫았다. 전사자들은 속출한다. “그래도 장사가 낫다”는 말도 사라졌다.
가게당 빚은 2000년 7131만원에서 작년 8859만원으로 늘었고 매출은 990만원에서 877만원으로 줄었다. 비명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치킨집은 4만개로 늘어났다. 커피점이 4만개, 자장면집이 2만5000개, 노래방이 3만개다. 골목길 빵집은 1만3000개가 넘고 큰 규모의 재래시장만도 1600개소다. 이 안에는 24만개의 칸막이 점포가 빼곡히 들어차 있다. 전국의 구멍가게 수는 7만6000개고 동네슈퍼가 8000개다. 50평 미만은 구멍가게고 1000평까지를 동네슈퍼라고 부른다. 행정관청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이런 규정을 만드는 일이다. 최근 무더기로 점포를 열고 있는 팥빙수집은 대체 몇 개에 이르면 정점을 칠까.
수억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고, 가맹본부에서 연수를 받고, 알바를 채용하고, 간판을 내걸고, 가슴의 흥분을 애써 억누르며, 하느님보다 더 간절하게 첫손님을 기다렸던 주인들이다. 빙수집 주인들의 마음은 벌써 팥죽보다 더 검은 색깔로 타들어가고 있다. 한때의 조개구이집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을까. 동네 목욕탕은 문을 닫은 지 오래고, 이발소는 그나마 살아남은 대중 목욕탕 한귀퉁이를 풍속화처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PC방들은 담배와 싸우는 중이고, 당구장은 초로의 신사들을 다시 불러모으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어쩌다 찾아든 한두 명 손님이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르는 한갓진 노래방 주인은 TV를 보며 시간을 죽인다. 마음은 타고 애간장은 끊어진다. 전국의 스크린 골프 열풍은 요즘은 어떤지. 돈은 부서지고 마음은 더 잘게 부서진다.
급기야 더는 참지 못한 정부가 지난주 대책을 내놨다. 포퓰리즘으로 새겨진 글씨들이다. 권리금을 보호하고 임대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등이 골자다. 자립의 상징 자영업이 국가가 보호해주어야 할 대상이 된 지도 오래다. 아뿔싸다. 그러나 하나를 보호하면 다른 하나가 죽는다. 임대업도 놀고 먹는 것이 아니다. 임대업의 본질은 금융업과 같다. 시간의 게임이다. 사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공생관계다. 경쟁과 협력을 구분하지 못하면 대책은 되레 시장을 파괴한다.
정규재 논설위원실장 jkj@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뉴욕증시, '매파 의사록'에 찬물…한은, 기준금리 동결 전망 [모닝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12608176.3.jpg)



!['매파 의사록'에 얼어붙은 투심…엔비디아 1000달러 돌파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ZA.36589088.1.jpg)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