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풍수] 일제 명당침탈의 현장, 홍릉
![[돈 버는 풍수] 일제 명당침탈의 현장, 홍릉](https://img.hankyung.com/photo/201401/AA.8217809.1.jpg)
1895년 경복궁에서 시해된 명성황후는 사후 2년이 지난 1897년에야 비로소 청량리에 안장됐다. 곧바로 장례를 치르지 않은 것은 강제로 화장된 황후의 유해는 부패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국법에 따른 장례보다는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명당을 찾아 예장하고픈 고종의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황후의 능은 22년간 홍릉으로 불리며 관리됐다. 그러다 1919년 고종이 승하하자 고종을 모신 금곡릉에 이장되면서 하나의 능으로 합쳐졌다.
일제는 중국의 옛 방식을 따라 홍릉을 천자의 능역으로 꾸몄다고 주장하지만 곳곳에선 조선을 우롱하고 기만한 흔적이 엿보인다. 조선 왕릉의 정자각은 뒷문을 열어 놓으면 능침(임금이나 왕비의 무덤)을 바로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홍릉의 침전은 능 앞의 산비탈면이 시선을 가로막아 침전 안에서 능침이 바라보이지 않는다. 능침을 바라보며 제사를 지내던 왕실의 효심을 옹골지게 차단시킨 것이다.
능침 앞 혼유석에 향로석을 설치한 것도 문제다. 백성 묘는 봉분 앞에 제물을 차려 놓는 상석과 향로석을 놓는다. 하지만 왕릉에는 제물을 차려 놓는 정자각이 능 아래 따로 있어 능 앞에 놓인 사각형의 넓은 판석은 상석이 아니라 혼령이 앉아 제수를 흠향하는 혼유석이다. 왕과 왕비를 합장한 능에는 항상 두 개의 혼유석이 능 앞에 놓인다. 그런데 홍릉에는 하나의 혼유석이 중앙에 놓여있고 그 앞쪽에 향로석까지 설치돼 있다. 홍릉이 황릉이 아닌 백성의 묘임을 은연중에 나타낸 것이다. 민족의 자존심을 생각하면 하루 빨리 향로석을 없애고 같은 형태의 혼유석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 격에 맞다.
홍릉은 산비탈면에 흙을 쌓고 붙여 지맥이 능 앞쪽까지 자연스럽게 뻗어온 것처럼 보이게 한 뒤 능침을 모셨다. 튼튼한 지맥 위가 아닌 성토한 땅 위에 능을 써 기가 허약하고 혈이 맺히지 않는다. 큰 비가 올 경우 능 뒤쪽에 떨어진 빗물이 능 안으로 흘러들어가 수렴(무덤 안에 물이 생김)의 피해를 입힌다. 묘 안에 수분이 많을 경우 겨울이 되면 얼면서 부피가 커지고 그 힘에 의해 둘레석이 힘없이 벌어져 틈이 생긴다.
홍릉의 왼쪽 아래에 있는 어정(우물)은 수맥의 피해가 크다는 것을 알려준다. 수맥이 지나가는 곳에 묘를 쓰면 봉분이 아래쪽으로 가라앉으며 유골은 까맣게 돼 후손이 편치 못하다. 그래서 백성의 묘도 수맥이 있는 곳은 꺼린다. 조선의 왕릉 중 능 아래에 우물이 있는 곳은 홍릉뿐이다. 일제는 홍릉터가 ‘매화낙지형’ 명당이라고 주장했다. 매화낙지형 명당이란 땅이 길해 묘를 쓰면 자손이 번성하고 큰 인물이 난다는 곳이다. 하지만 홍릉은 명백히 허화(虛花·발복이 없는 묘지)에 지나지 않는다. 일제는 조선을 억누르고 발복을 막기 위해 흉지를 명당이라 거짓 선전한 것이다.
고제희 < 대동풍수지리학회장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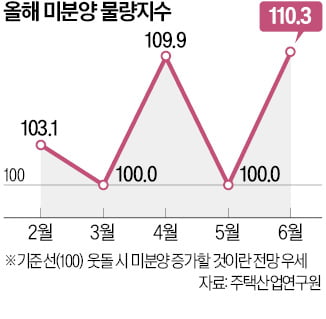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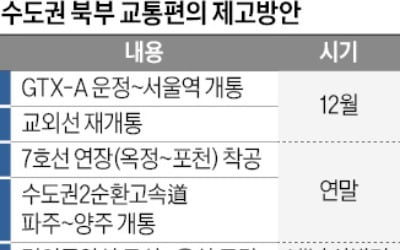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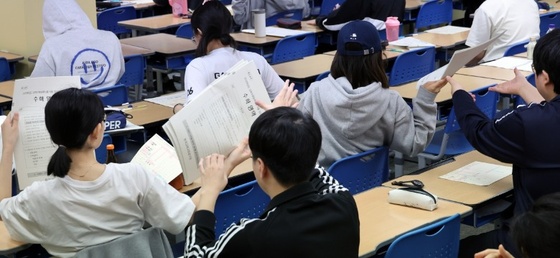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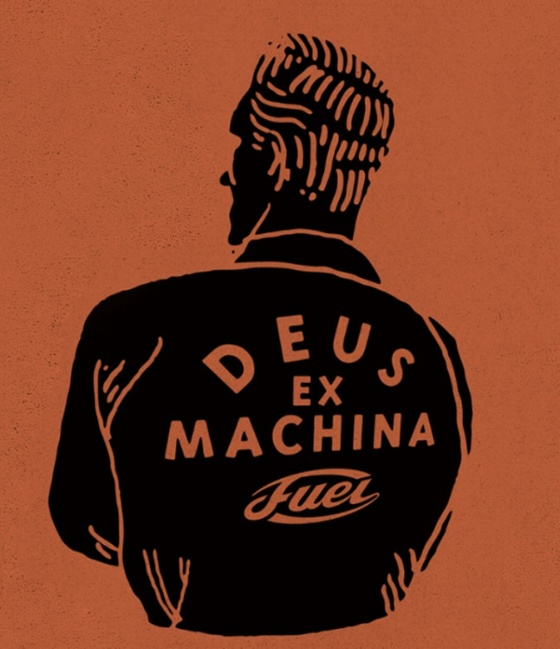
!["만듦새 좋아 15년 공연, 150주년도 기대"…뮤지컬 '영웅'의 자신감 [종합]](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3.3693421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