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디자인?…'예쁜 상품' 아닌 '좋은 경험 담긴 상품'이 잘 팔리죠
창의성 통한 디자인 혁신…천배 만배의 가치 창출 가능
美 디자인 연구실 가보면 미술 전공자 20% 안팎…다양한 사람들이 결과 만들어
보기에 좋고 사용후 좋은 고객 움직이는 기능이 '키워드'
“질문 있으십니까?”
KAIST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AIM) 가을학기 열한 번째 시간. 나건 홍익대 국제디자인대학원 디자인경영학 교수는 대뜸 질문 있냐는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수업을 한 게 없는데….’ 수강생들은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수업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질문으로 시작해 봤습니다. 예전에는 교수가 수업하다 ‘질문 있나’라고 물으면 슬슬 수업 끝내자는 얘기였죠. 요즘은 수업이 끝날 때쯤 학생에게 질문을 받으면 그때부터 다시 수업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집니다. 대학원 수업은 특히 교수가 몇몇 핵심만 얘기한 뒤 학생이 던지는 질문을 중심으로 풀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을 수업 가장 첫머리에 받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수업의 트렌드를 예상해 본 것이죠.”
나 교수는 한양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산업공학 석사, 미국 터프츠대에서 공업디자인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부터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레드닷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만 배 가치를 만드는 혁신
“기술의 흐름, 트렌드는 산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디자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트렌드를 포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세상은 트렌드를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교수도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질문은 교수와 수업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하죠. 저 같은 경우 3년 전에 한 학생이 던진 ‘혁신(innovation)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혁신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변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나 교수는 교실 스크린에 ‘독창성→창의성→혁신’으로 이어지는 그림이 그려진 화면을 띄웠다. “독창성, 창의성, 혁신은 모두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 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차이점은 뭘까요. 저는 가치로 봅니다. 일단 독창성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되지 않는 것이죠. 창의성에는 가치가 있긴 있습니다. 숫자로 얘기하면 열 배 정도 될까요. 혁신은 천 배 만 배의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업이 혁신에 목매는 것은 새로운 뭔가를 통해 전혀 다른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교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창의성을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을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가장 이질적인 요소가 만날 때 가장 새로운 것이 탄생한다는 것이다. 창의성을 발현하는 길은 융합, 관점의 전환, 관찰이 핵심이라고 제시했다.
○“우리 모두는 디자이너다”
‘우리 모두는 디자이너다.’ 20세기 디자인 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빅터 파파넥은 그의 책 ‘진짜 세상을 위한 디자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파파넥은 디자인이 사람과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주로 연구한 교육자이자 디자이너로 “디자인이 단순하게 기술적인 것이나 보이는 데 치중하게 되면 진정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놓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여러분도 모든 사람이 디자이너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내 분위기는 그렇진 않죠. 학부에서 디자인을 했냐 아니냐로 디자이너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 국민의 70%는 디자이너라고 하면 앙드레 김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디자인 연구실에 가보면 학부 때 미술을 전공한 사람은 20%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디자인을 하죠. 그러니 결과물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디자인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개척한 학자 존 헤스켓은 ‘디자인은 디자인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디자인을 디자인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이처럼 디자인에는 실행, 계획, 결과물 등 다양한 의미와 용도가 있다는 점도 앞으로 이해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팔리는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
나 교수는 한 사회 또는 국가의 사람들이 디자인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수준을 세 단계로 구분했다. 기초 단계는 스타일링이다. 제품을 보기 좋게 만드는 것 정도다. 그 다음 단계는 디자인을 과정으로 보는 수준이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은 디자인을 혁신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단계다. 나 교수가 앞서 혁신을 얘기한 것은 디자인의 이 부분과 일맥상통한다. 디자인을 통해 천 배, 만 배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디자인에 대해 이 세 가지 단계가 혼재하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디자인을 잘 하라’고 합니다. 그럼 임직원들은 ‘제품을 예쁘게 만들어야겠다’고 받아들이죠. 하지만 CEO가 ‘물건을 예쁘게 만들어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많이 팔리는 제품을 만들어라’고 했겠습니까. 기업에서 신제품 디자인을 만든다고 합시다. 디자이너들끼리 모여서 시제품을 만들면 별로 걸림돌이 없습니다. 다들 ‘스타일 죽인다’고 하며 디자인을 결정하죠. 하지만 CEO에게 시제품을 가져가면 퇴짜맞기 일쑤입니다. CEO가 묻는 ‘왜 좋냐’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디자이너들이 느끼는 ‘스타일 죽인다’는 느낌을 경영의 언어로 바꿔줘야 합니다.”
○좋은 디자인은 고객에게 좋은 경험을 준다
나 교수는 교실 화면에 ‘팔리는’ 디자인 제품들을 잇따라 띄웠다. 필립 스탁이 디자인한 파리채 ‘닥터 스커드’와 알레산드로 멘디니의 와인 따개 ‘안나’와 ‘산드로’ 등이다.
“닥터 스커드는 디자이너 스탁이 자신의 얼굴을 그려넣어 장식품처럼 만들었습니다. 네 개 세트가 5만원가량 하는데 장식품으로 놓기도 좋아서 집들이 선물로 인기죠. 안나는 멘디니보다 30살 정도 어린 부인 이름입니다. 멘디니는 ‘와이프를 너무 사랑해서 이런 디자인이 나왔다’고 합니다. 안나를 들고 와인을 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선 양 팔이 위로 쭉 올라가죠. 자신한테 항복하는 와이프를 떠올리는 겁니다. 와인을 딸 때는 목을 비틀어서 따죠. 화가 났을 때 이런 식으로 푼다는 겁니다. 안나의 디자인에 얽힌 이런 사연을 들으면 누구나 웃게 되고, 하나쯤 사고 싶어지죠. 산드로는 안나의 후속 제품입니다. 좋은 디자인이란 이렇게 고객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경영 혁신의 핵심’
이제 경영에 있어서 디자인을 이야기해볼 차례다. 나 교수는 ‘디자인은 경영 혁신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스티브 잡스가 1997년 9월16일 애플의 CEO로 복귀했습니다. 바로 이틀 뒤 기자회견에서 ‘애플의 핵심 전략은 산업 디자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잡스는 ‘디자인은 사람이 만든 창조물의 근본적인 영혼이다. 그것은 어떻게 보이고 느껴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기능하느냐의 문제’라고 했죠. 이 말은 잡스가 세상을 떠난 지금도 디자인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설명으로 쓰입니다.”
미국 최대 디자인 연구소 중 하나인 랜더어소시에이츠의 창업자 월터 랜더는 “제품은 공장에서 만들어지지만, 브랜드는 고객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디자인은 무엇일까. 나 교수는 ‘척 보기에도 좋고, 사용해 보니 좋고, 사용한 뒤에도 좋은’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라고 제시했다.
“요즘 디자인은 고객에게 어떻게 긍정적인 감정을 줄 수 있느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종류가 너무나 많아지고, 성능도 상향 평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 좋은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죠. 단순히 ‘예쁜 상품’이 아니라 ‘그 물건을 쓰는 고객이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상품’이 결국 많이 팔린다는 것입니다. 물건(things) 디자인에서 생각(thinking) 디자인으로, 나아가 서비스 디자인으로 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도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사람의 경험, 감정, 문화
나 교수는 수강생들에게 미래학자 존 나이스빗이 쓴 ‘마인드 셋’의 한 대목을 소개했다.
“나이스빗은 ‘많은 것이 변하긴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잘 관찰하면서 변하는 요소와 변하지 않는 요소를 잘 솎아내면, 그 안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책임이 많은 자리에 있을수록, 또는 가방끈이 길수록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는 것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큰 그림으로 보려면 ‘무엇’과 ‘어떻게’를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 나이스빗의 주장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인간에 답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업계의 최대 이슈 역시 사람의 경험, 감정, 문화가 맞물리는 부분을 어떻게 디자인으로 접근할 것인가입니다. 나와 다른 인간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디자인이 비즈니스에서도 혁신을 낳을 수 있습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강의 = 나건 <홍익대 국제디자인대학원 디자인경영학 교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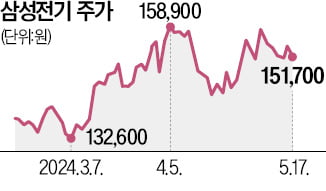


![서학개미 뒤집어졌다…다우지수 종가기준 첫 4만선 돌파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AD.36579999.1.jpg)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