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다세대 세입자 울린 전셋값 통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하지만 매주 발표되는 부동산 시세동향에는 김씨와 같은 다가구 · 다세대 세입자가 없다. 모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지난주 동대문구 전셋값은 0.01%,성동구는 0.16% 오르는데 그쳐 서울 평균 0.22%에 못 미쳤다. 김씨가 겪고 있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수치다. 다가구 · 다세대 주택은 원천적으로 통계에서 제외되고 아파트만 대상으로 매매가와 전셋값 변동률을 따지다보니 생긴 결과다.
8월 초 전셋값 앙등이 본격적인 문제가 됐을 때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송파구 잠실 일대 전셋값이 신규 입주 아파트 물량과 금융위기로 반토막 났던 점을 들어 "재건축아파트들의 입주가 마무리되고 시세가 회복되면서 생긴 착시효과"라고 설명했다. 다가구 · 다세대주택의 임대료 앙등문제가 강북을 비롯한 서울 전역에서 서민들의 목구멍까지 차오른 상황에서 정부 당국자들의 시각은 여전히 강남권 아파트에만 맞춰져 있었던 것이다.
기자를 비롯한 언론의 잘못도 크다. 강남권 아파트의 시세를 보도하는 데 정신이 팔려 훨씬 더 많은 수요자들이 설움을 받는 전셋값 동향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다세대 · 다가구주택의 공급량이 급감했음을 보여주는 '주택 유형별 건축 인허가 건수'는 국토해양부가 매달 집계하지만 언론에는 8월 말에야 기사화됐다.
정부가 부랴부랴 보금자리주택을 비롯한 서민주택 조기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김씨를 비롯한 다가구 · 다세대주택 서민세입자의 설움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 다가구 · 다세대 주택 공급량이 지난해의 10% 수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재개발에 따른 철거는 오히려 더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서울에서 아파트에 사는 세대 비율은 43.89%.나머지는 단독주택과 다가구 · 다세대주택에 산다. 이 중에는 세들어 사는 사람들이 많다. 전셋값 대책을 서민대책의 우선 순위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노경목 건설부동산부 기자 autonomy@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24억 꽂았다"…권은비, '이 동네' 건물 왜 샀나 했더니 [집코노미-핫! 부동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6960850.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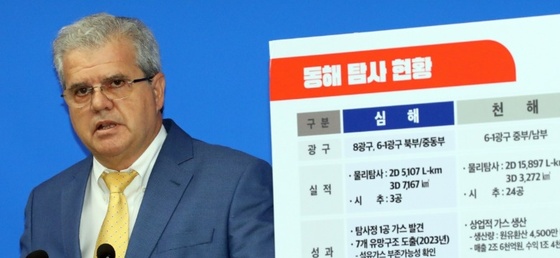

![반나절 만에 3,200억 원 손실…시장 흔든 트레이더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08064644263.jpg)








![[고침] 문화([신간] 병자호란과 삼전도 항복의 후유증은…)](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ZK.3696860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