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논란 큰 간호법 이렇게 서두를 일인가
간호법은 2021년 3월 여야 의원 세 명이 처음 발의했다. 취지는 이해할 만했다. 70년 된 낡은 의료법만으로는 점차 다양화·전문화하는 간호 영역을 체계적으로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법에 명기된 ‘진료의 보조’ 대신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했다. 의사만으로 부족한 기초 의료에 간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늘어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할 필요도 있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간호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의된 이 법안은 취지가 무색하게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했다.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의료 직군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의사협회는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지휘 밖에서 독자적으로 의료 활동을 함으로써 의사의 업무 영역을 침범, 의료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진료의 보조’ 대신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란 문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행하는 과정에서 지워졌다. 현행 의료법 문구와 거의 비슷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바뀌었다. 그러자 이번엔 법안 총칙에 있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이라는 표현으로 논란이 일었다. 의사협회는 이 문구가 ‘간호사 단독 개원’을 열어주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갈등에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도 뛰어들었다.
간호법 자체가 알맹이가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간호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간호사의 권리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쯤 되니 전문가들은 의료법이 있는데 간호법이 왜 필요하냐는 의문까지 제기한다.
곳곳이 논란거리인 데다 실효성도 모호한 이 법안을 국회 상임위에선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 버렸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반사이익을 노리는 다수당의 횡포라는 의심을 살 만하다. 입법이 능사가 아니다. 국민건강권을 위해선 지금이라도 차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직역 간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뜨겁다고 하지 않겠다"…CPI 앞두고 사상 최고가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20107473384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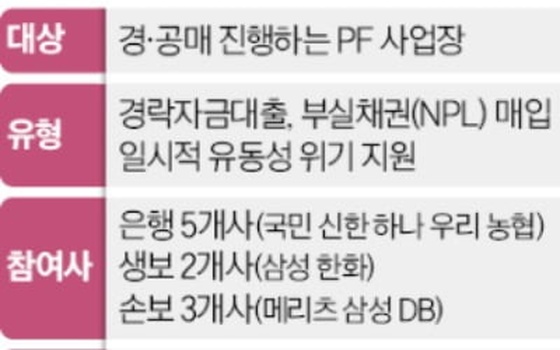
![[단독] '전기차 끝판왕' GV90 내년 12월 출격](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22134.1.jpg)


![[단독] "1억이 7억 된다" 달콤한 유혹…교수도 넋놓고 당했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00558.3.jpg)


![[이 아침의 안무가] 발레에 소소한 일상 담은 안무가, 케네스 맥밀런](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AA.3672249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