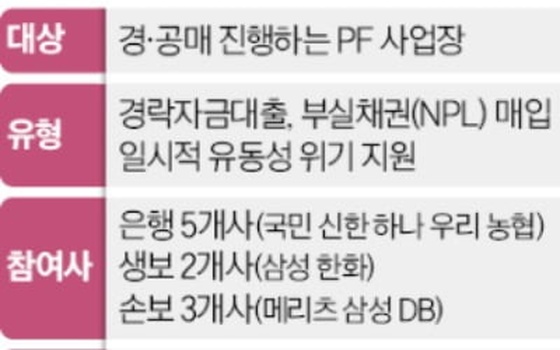[편집국에서] 알리바바와 서브원, 출발은 같았지만…
규제에 막힌 서브원은 MRO 분할 추진
안재석 산업부 차장
![[편집국에서] 알리바바와 서브원, 출발은 같았지만…](https://img.hankyung.com/photo/201810/07.16674129.1.jpg)
알리바바가 설립될 무렵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업모델을 가진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졌다.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사업부를 만들고, 어느 정도 안착한 뒤에는 별도 법인으로 분리했다.
20년이 흐른 뒤 두 나라 기업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등에 업은 알리바바는 공룡만큼 빨리 성장했다. 중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다. 알리바바는 일반인 대상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순식간에 거대그룹으로 비약했다.
반면 한국 MRO 업체들은 죄다 날개가 꺾였다. ‘일감 몰아주기’라는 ‘주홍글씨’가 성장판을 닫아버렸다. 삼성 등 대부분 기업은 매각 등을 통해 MRO 시장에서 줄줄이 철수했다. 주요 그룹 가운데 LG 정도만 서브원이라는 회사로 명맥을 잇고 있다. 하지만 이 회사도 조만간 다른 길을 가게 된다.
서브원은 지난 19일 “MRO 사업 분할 및 외부자본 유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사모펀드 등과 다양하게 접촉 중”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MRO 사업 지분 상당부분을 내다 팔겠다는 뜻이다. 서브원은 LG그룹 지주회사인 (주)LG가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지난해 매출 6조8900억원, 영업이익 2100억원을 기록했다.
자발적인 매각으로 보이지만 속내는 다르다. 강화될 예정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결정적인 배경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MRO 사업은 ‘규모’가 관건이다. 덩치가 커야 ‘바잉 파워’가 생긴다. 그래야 단가를 낮출 수 있고, 큰 고객도 유치할 수 있다. 물품을 대는 중소기업도 대기업이 ‘중개’를 해야 유리하다. 판매대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수출 판로를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한국 MRO 업체들은 시장이 상대적으로 협소하다는 약점을 같은 그룹 내 계열사의 구매 물량을 한 곳으로 몰아주는 방식으로 극복했다. 전체 일감에서 ‘내부 주문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브원은 전체 매출의 60%가량이 여기에 해당한다.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보면 일감 몰아주기가 된다. 반대로 나머지 40%에 주목하면 결론이 다르게 나온다. 서브원을 활용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2조원 이상의 안정적인 신(新)시장이 열린 것이다. 해외 매출도 1조원에 달한다. 해외 영업력이 떨어지는 개별 중소기업은 해내기 어려운 성과다. 일감 몰아주기라는 오명을 쓴 60% 역시 공급처는 수만 개의 중소기업이다.
서브원이 MRO 사업을 분할한다고 발표하자 곧바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서브원 매각 안 됩니다’, ‘양질의 일자리 없애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철회하라!’는 두 건의 글이 올라왔다. 대기업 총수를 ‘사익 편취’라는 색안경을 끼고 재단하는 바람에 애꿎은 일자리만 불안해졌다는 하소연이 골자다. 게시판 글은 정부와 정치권에 이렇게 되물었다. “대기업 MRO 자리를 대신한 중소 MRO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나? 효율성은 올라갔나? 구매단가는 내려갔나?”
yago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뜨겁다고 하지 않겠다"…CPI 앞두고 사상 최고가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20107473384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