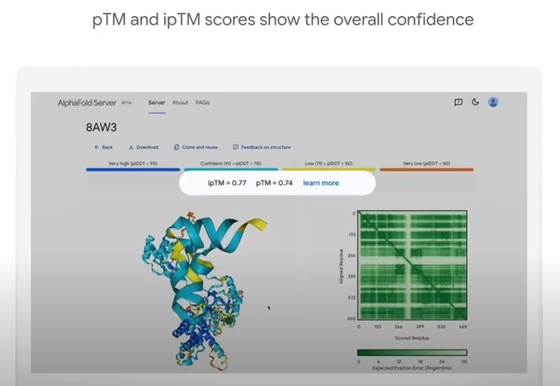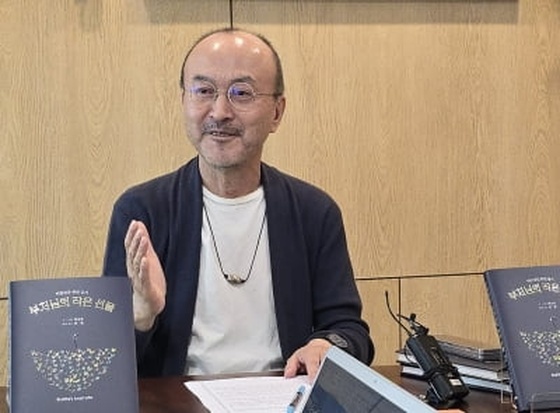입력2006.04.03 00:08
수정2006.04.03 00:11
성전 < 부산 내원정사 스님 >
동자들이 머리를 깎는다. 일주일간 절에서 스님으로 사는 것이다. 머리를 깎으면서도 아이들은 울지 않는다. 나보다 낫다.
나는 삭발을 할 때 눈물을 글썽였다.
유치원 아이들이 만든 예쁜 연등도 걸었다. 부산 내원정사의 부처님 오신 날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고사리 손으로 연등을 만들고 개구쟁이들이 삭발을 하고…. 다른 절에선 볼 수 없는 천진한 풍경들이다.
문득 극락세계의 모습이 저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린아이들 뒤에서는 초로의 주지 스님이 웃고 보살님들은 아이들을 예쁘게 치장해 법당 앞에 줄을 세우고 있다.
삶은 언제나 이렇게 순하고 여리다.
동자승의 작은 미소 한 조각에도,피부를 스치고 지나는 한 줌 바람에도 쉽게 그리움을 건넬 만큼 순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루어져 있다.
그 마음 자리에 누구를 미워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거칠고 투박한 마음은 차지할 자리가 없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맑은 길을 어린 시절에 보았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밝은 빛도 그때 보았다.
어릴 때 아무런 뜻도 모르고 석가모니불을 염불하며 오르던 산사의 길과 어둠을 밝히던 등불….
그 불빛은 약하지만 따뜻했고,그 길은 좁았지만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그 길들은 모두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 많은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을 택했다.
그 길은 내 어린 시절 등불을 의지해 걷던,산사에 이르던 길이다.
그 길의 끝에는 내가 모든 생명을 바쳐 돌아가 의지하고픈 위대한 깨달음의 사람이 있다.
위대한 자비의 사람,붓다가 바로 그다.
그의 자비 앞에서 세상은 무상했고 존재는 언제나 슬픈 것이었다.
나고,늙고,병들고,죽는 이 생로병사의 윤회 속에서 슬프지 않은 존재는 아무도 없었다.
붓다는 울었다.
그리고 가슴 깊숙한 곳을 흐르는 눈물 속에서 그는 선명하게 다가오는 탄생의 외침을 보았을 것이다.
자비가 아니면 결코 일깨울 수 없었던 탄생의 외침,고해(苦海)의 세계에 사는 모든 이들을 내가 모두 제도(濟度)하겠다는 큰 원력의 일성을 그는 마침내 들은 것이다.
그것은 길의 시작이었다.
인간 고타마가 위대한 깨달음의 사람이 되는 순간이었다.
붓다는 그 길을 가기 위해 아버지가 건네는 권력도,부인도,아들마저도 버렸다.
그리고 새벽 강에서 머리를 자를 때 세상을 향한 마지막 미련까지도 버렸다.
버릴 것을 다 버린 가벼운 존재로 붓다는 길을 떠났다.
더 이상의 두려움도 슬픔도 그에게는 남아 있지 않았다.
그에게는 다만 세상과 존재에 대한 연민과 깨달음에 대한 열망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길은 언제나 그 길을 걷는 사람을 향해 열린다.
붓다가 길을 걷기 전, 그리고 그 길 끝에서 깨달음의 일성(一聲)을 말하기 전 우리에게 길은 없었다.
있었다 할지라도 그 길은 길이 아니었다.
그 길은 혼돈이었고 불행이었고 아득한 추락을 향해 난 길이었다.
어둠이 드리워져 이룬 그 길은 무명과 미혹과 윤회의 길이었다.
그 길은 각자의 길이었지 우리 모두가 함께 갈 길은 아니었다.
그러나 붓다가 자비 원력으로 길을 걸어 그 길의 끝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의 길을 벗어난 생명의 길을 볼 수 있었다.
그의 길은 넓고 크고 곧다.
그의 길은 개체가 우주가 되고,미움이 사랑이 되고,거짓이 진실이 되는 길이고 네가 곧 내가 되는 길이다.
그의 길에는 이 세상 끝까지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다함이 없는 연민이 자리하고 있다.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그의 길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서있다.
그리고 그의 길 위에 오늘 나 또한 서 있다.
그러나 나의 출가에는 붓다의 자비와 버림이 없다.
버리고자 하지만 애착은 그림자처럼 내 뒤를 쫓아오고,자비를 지니고자 하지만 '나'는 언제나 타인보다 앞서 내게 다가온다.
새벽 강에 선 붓다의 버림과 자비의 원력은 아직도 내겐 꿈이요 서원일까.
동자승 하나가 내게 달려와 와락 안긴다.
우리 절에 오신 부처님.나는 동자승을 안고 이렇게 맑고 순수한 세상을 향해 서원 하나를 새긴다.
/'행복하게 미소짓는 법' 저자
![[허원순 칼럼] 국가 최상의 신뢰 시스템, 누가 화폐를 흔드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30347388.3.jpg)
![[차장 칼럼] 또다시 해양 패권의 卒로 전락할텐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32531306.3.jpg)
![[취재수첩] K스타트업의 '일본 러시' 이대로 괜찮을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20116573.3.jpg)


![화웨이에 반도체 수출금지 '직격탄'...인텔 2.2% 급락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090647304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