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하이닉스 "큰 고비 넘겼다"…일부선 "머릿수만 채우는 식 안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업계에선 이날 정부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한 것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특정 산업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범부처 대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고, 특성화 대학 지정, 연구개발(R&D) 과제 확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10년 뒤 총 15만 명을 양성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당초 정부와 업계가 10년 뒤 필요하다고 판단한 인력 수요보다 2만3000명 많은 수준이다. 산업계는 모수가 커진 만큼 반도체산업으로 유입될 인력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은 단순 전공자가 아닌, 석·박사급 고급 인력이라는 점에서 매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분야는 기술 난도 등을 감안하면 석·박사급 연구를 통한 훈련이 중요하다”며 “머릿수만 채우는 식이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중견 반도체회사 최고경영자(CEO)는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얼마나 양성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빠르게 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있었다. 한 반도체 장비업체 부사장은 “교육을 한다고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양질의 인재가 배출되지는 않는다”며 “당장 바뀌는 것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 정원 감축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각 대학에 반도체 학과 정원을 늘릴 기반은 마련됐지만, 시행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한 반도체 장비업체 대표는 “대학별 반도체 교육을 특성화할 구체적인 구상은 빠져 있다”며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소재, 공정장비 등 분야가 넓기 때문에 세분화한 교육이 필요한데 ‘수박 겉핥기’ 식일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지은/민경진 기자 jeong@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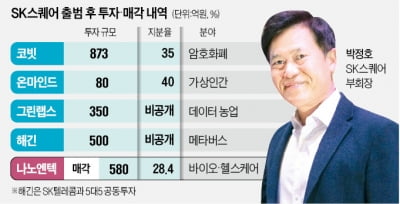




![고용둔화 조짐에 투자심리 회복…나스닥 1.99%↑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ZA.36560217.1.jpg)

![[단독] 신협, 연체율 관리 총력…부실채권 투자社 설립](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AA.36551861.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