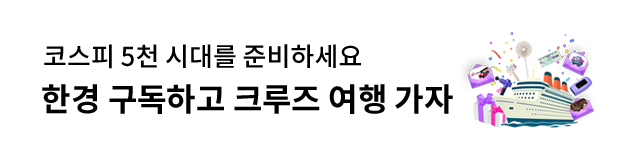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끼워팔기, 자사 우대, 최혜 대우, 멀티호밍(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네 가지 경쟁 제한 행위를 제어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이런 반칙 행위는 기존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조항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 ‘중복 규제’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더구나 1999년 폐지된 사전지정제까지 되살려 국내 플랫폼을 옭아매겠다는 발상은 거대한 행정 편의주의이자 규제 만능주의가 아닐 수 없다. 역차별 우려 역시 크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을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할 방침이라지만 국경 없는 인터넷 환경에서 해외 기업, 특히 중국의 거대 플랫폼과 사실상 이들을 관리하는 중국 정부를 상대로 얼마나 규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럽의 플랫폼법을 들어 입법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도 견강부회다. 우리나라와 달리 자국의 유력한 플랫폼이 없는 유럽이 디지털시장법을 도입한 건 오히려 글로벌 빅테크를 견제해 자국 플랫폼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가뜩이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쇼핑앱들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을 무섭게 잠식하는 상황이다. 이런 환경에서 국내 플랫폼의 손발을 묶는 것은 곤란하다. 규제는 한 번 만들어지면 폐지하기 어렵다. 플랫폼법과 같은 무리한 법안은 수정이 아니라 폐기가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