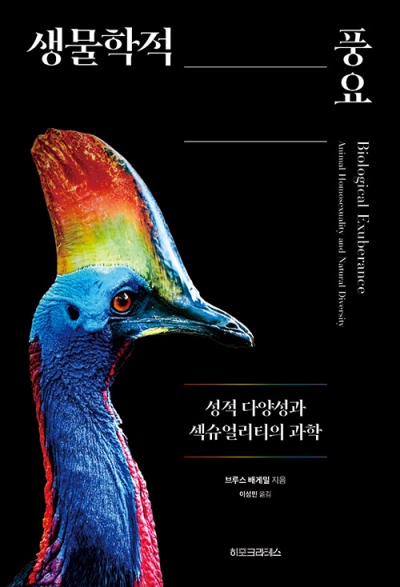그들은 시장을 이기려 않고, 다만 쫓아가면서 돈을 챙겼다 [책마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투자의 구원자들
로빈 위글스워스 지음
고영태 옮김/한빛비
428쪽|2만7000원
로빈 위글스워스 지음
고영태 옮김/한빛비
428쪽|2만7000원
![그들은 시장을 이기려 않고, 다만 쫓아가면서 돈을 챙겼다 [책마을]](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1.34208889.1.jpg)
이렇게 말한 워런 버핏에게 2007년 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도전장을 냈다. 재간접 헤지펀드 운용사인 프로테제파트너스를 공동 설립한 테드 세이즈였다. 100만달러를 걸고 버핏은 S&P500지수를 따르는 인덱스펀드에, 세이즈는 5개의 재간접 헤지펀드에 분산 투자했다.
처음엔 버핏이 굴욕을 당하는 듯했다. 금융위기가 덮친 2008년 인덱스펀드는 37% 손실을 냈다. 헤지펀드도 손실을 봤지만 그보다 나은 20%대 초반이었다. 하지만 증시가 급반등한 2009년을 포함해 그 이후 매년 인덱스펀드가 앞섰다. 약속한 10년 동안 인덱스펀드는 7.1%, 헤지펀드는 2.1% 수익률을 냈다. 버핏의 승리였다.
오늘날 지수 추종 전략으로 운용되는 자금은 전 세계적으로 26조달러(약 3경4000조원)에 이른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아이셰어즈’라는 브랜드의 상장지수펀드(ETF)가 대표 상품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등 모두 ETF에 혈안이다.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사람이 자꾸만 줄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의 구원자들>은 ‘인덱스펀드 혁명’의 주역들과 그 역사를 다룬 책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자인 저자는 오랫동안 금융 분야를 취재하며 만난 버핏, 존 보글, 래리 핑크 등 거물들을 통해 인덱스펀드 탄생 이면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되살려낸다. 금융 역사서이자 여러 인물을 다룬 전기다.
![그들은 시장을 이기려 않고, 다만 쫓아가면서 돈을 챙겼다 [책마을]](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1.34208761.1.jpg)
바슐리에의 박사 학위 논문은 ‘확률 계산법의 주식시장 운용 적용’이었다. 복잡한 수학식이 포함된 논문이지만 요지는 간단했다. 매수자는 주가가 오를 것이라 생각해 주식을 사고, 매도자는 떨어질 것이라 생각해 판다. 주가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그 결과 주가는 무작위적 움직임을 보인다.
주가가 마치 동전 던지기처럼 무작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추세나 반전 신호를 찾으려는 노력은 모두 허사라는 이 ‘랜덤워크 이론’은 점점 학계에 퍼져나갔다. 이는 1965년 발표된 유진 파마의 ‘효율적 시장 가설’로 발전했다.
학계는 빠르게 생각을 바꿔나갔지만 업계는 보수적이었다. 인덱스펀드 개발 노력에 무관심과 조롱, 비판,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 한 펀드매니저는 “랜덤워크 이론은 단지 펀드매니저들을 질투하는 경영대학원의 많은 교수가 만들어 낸 창작품에 불과합니다. 펀드매니저들이 교수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이죠”라며 불평했다.
1975년 존 보글이 뱅가드를 설립하면서 인덱스펀드의 대중화가 시작됐다. 뱅가드도 출발은 시원찮았다. ‘퍼스트 인덱스 투자신탁’(현 뱅가드500 인덱스펀드)는 처음 펀드를 열면서 1132만달러의 자금을 모으는 데 그쳤다.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S&P500 종목은 280개뿐이었다. 겨우 지수를 추종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후 증시가 불황을 겪으면서 투자자들이 비용에 민감해졌다. 1978년 미국인들이 주식 펀드를 통해 연금을 저축하도록 한 ‘401(k)’가 도입되면서 인덱스펀드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뱅가드500은 2000년 4월에는 피델리티의 유명한 마젤란 펀드를 제치고 1072억원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뮤추얼 펀드로 올라섰다.
책이 다루는 역사는 ETF의 발명, 블랙록의 바클레이즈 글로벌 인베스터즈 인수, 패시브 투자에 대한 비판 여론 등 최근 상황까지 이어진다. 인덱스 펀드의 역사를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생생히 접하기에 좋은 책이다. 다만 초점이 너무 인물에 맞추어져 있다. 인덱스펀드가 금융시장에 가져온 변화를 입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는다. 이런 금융시장에 대한 역사서가 제법 많이 나와 있는데,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해 우리가 쓰는 방법들 [책마을]](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1.3420729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