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주 중 돈 되는 투자개발은 10%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업 발굴부터 운영·유지까지
단순 시공보다 수익성 높아
정부 금융 지원·건설 외교 중요
단순 시공보다 수익성 높아
정부 금융 지원·건설 외교 중요
국내 건설사의 해외 사업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단순 도급이 아니라 투자개발 사업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선 개별 건설사의 지역별 전문가 양성, 리스크 관리 능력 확대 등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금융 지원과 건설 외교가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6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작년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금액 306억달러 가운데 투자개발 사업은 8.1% 수준인 25억달러로 집계됐다. 나머지 92%가량(281억달러)이 도급 사업이다.
투자개발 사업은 이름 그대로 반드시 ‘투자(파이낸싱)’를 함께 하는 사업을 뜻한다. 사업발굴, 기획, 타당성 조사 등과 같은 시공 이전 단계뿐 아니라 운영 및 유지 관리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투자개발 사업은 금융, 기술, 법률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리스크가 큰 대신 수익성이 높다.
2010년 이후 해외 사업의 실적 악화 주범으로 단순 도급 위주의 사업 구조가 꼽히면서 투자개발 사업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투자개발 사업 규모는 전체 해외 수주의 10% 이내에 불과하다. 2019년엔 전체의 8.0%,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2020년은 1.7%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향후 열릴 해외 원전 입찰, 중동발 3차 대규모 발주 등 대형 인프라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선 정부의 금융 지원을 뛰어넘는 종합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 수주전에 뛰어들 때는 금융과 기술을 총망라한 ‘국가 대항전’이 벌어지는 만큼 건설 외교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대규모 원자력발전 수주전이 대표적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통상 대규모 원전 수주에선 입찰 서류만 기업이 작성하고 실제 입찰 경쟁력은 정부의 정책과 지원에 의해 결정된다”며 “원전 사업은 인허가, 핵연료 등의 문제가 엮인 만큼 정부가 필연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체코와 폴란드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 기업이 수주 물꼬를 틀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경영연구실 연구위원은 “해외 선진 기업들이 잘하는 건 금융 조달과 기획, 건설사업관리(PM) 등 수익성 높은 분야”라며 “국내 기업도 도급형 사업보다는 고부가가치 투자개발 사업 경쟁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6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작년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금액 306억달러 가운데 투자개발 사업은 8.1% 수준인 25억달러로 집계됐다. 나머지 92%가량(281억달러)이 도급 사업이다.
투자개발 사업은 이름 그대로 반드시 ‘투자(파이낸싱)’를 함께 하는 사업을 뜻한다. 사업발굴, 기획, 타당성 조사 등과 같은 시공 이전 단계뿐 아니라 운영 및 유지 관리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투자개발 사업은 금융, 기술, 법률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리스크가 큰 대신 수익성이 높다.
2010년 이후 해외 사업의 실적 악화 주범으로 단순 도급 위주의 사업 구조가 꼽히면서 투자개발 사업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투자개발 사업 규모는 전체 해외 수주의 10% 이내에 불과하다. 2019년엔 전체의 8.0%,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2020년은 1.7%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향후 열릴 해외 원전 입찰, 중동발 3차 대규모 발주 등 대형 인프라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선 정부의 금융 지원을 뛰어넘는 종합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 수주전에 뛰어들 때는 금융과 기술을 총망라한 ‘국가 대항전’이 벌어지는 만큼 건설 외교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대규모 원자력발전 수주전이 대표적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통상 대규모 원전 수주에선 입찰 서류만 기업이 작성하고 실제 입찰 경쟁력은 정부의 정책과 지원에 의해 결정된다”며 “원전 사업은 인허가, 핵연료 등의 문제가 엮인 만큼 정부가 필연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체코와 폴란드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 기업이 수주 물꼬를 틀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경영연구실 연구위원은 “해외 선진 기업들이 잘하는 건 금융 조달과 기획, 건설사업관리(PM) 등 수익성 높은 분야”라며 “국내 기업도 도급형 사업보다는 고부가가치 투자개발 사업 경쟁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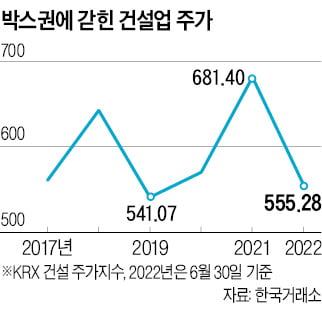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