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대선후보군, 지금부터 지켜보자
자질·정책 알려하기보다
아무렇게나 투표·기권하는 이 많아
개인에게는 합리적일지 몰라도
민주주의 손상될 수 있어
후보 개인과 정책에 관심 갖기를
이영조 <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 >
![[다산 칼럼] 대선후보군, 지금부터 지켜보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07.14412923.1.jpg)
선호의 형성과 전달을 보장하기 위해 이른바 기본권으로 알려진 각종 자유가 주어진다. 언론의 자유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표현과 결사의 자유는 선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당 활동의 보장도 같은 목적을 지닌다. ‘평등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말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정치적 결정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모두 다 평등하게 고려된다는 이야기다. 이를 보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자유·평등·보통·비밀 선거다.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권자인 시민이 선호, 즉 원하는 바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수동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가한다든가, 의원들을 접촉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주권자에게 선거야말로 선호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다.
이렇게 중요한 선거이지만, 이 귀중한 기회를 숫제 포기하거나 투표를 하더라도 후보의 자질이나 정책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는 유권자가 적지 않다. 혈연, 지연, 학연만 보고 투표하거나 ‘줄투표’를 하는 게 그런 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비용과 편익이 따른다. 투표같이 간단해 보이는 일에도 비용은 있게 마련이다. 후보와 정책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약간이라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투표장에 가서 줄 서서 기다리고 투표하는 그 시간에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행을 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편익은 어떤가? 경쟁하는 후보 사이에 정책 차이가 크면 클수록 특정 후보에게 투표할 때 편익은 그만큼 커진다. 하지만 기대편익은 이 차이에 내가 던지는 한 표가 선거 결과에 미칠 확률을 곱해야 한다. 그런데 적지 않은 유권자들은 내 한 표가 당락을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적지 않은 선거구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걸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데 말이다). 그래서 이들은 후보와 정책에 대해 알기 위해 내는 정보비용 그리고 투표장에 가는 기회비용이 기대편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고 기권하거나 아무렇게나 투표한다. 정치경제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합리적 기권’, ‘합리적 무지’라고 부른다.
기권과 무지가 개인 차원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사회적 차원에서는 민주주의가 손상되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 민주국가의 시민이라면 이렇게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행위는 피해야 마땅하다. 사실 큰 ‘비용’이 드는 것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투표 참가 비용은 사전투표제로 인해 더 이상 크지 않다. 후보와 정책에 대한 정보는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쉽게 얻을 수 있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등록이 있었다. 모두 9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야권 후보군도 지난달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활동 선언으로 윤곽이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검증은 내년 3월 선거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미리미리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만 봐도 각 후보의 사람됨이나 정책 지향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미시적으로는 합리적인 행동이 거시적으로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낳는 경우가 적지 않다. 투표와 선거도 그런 예의 하나다.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탓할 생각은 없지만 민주시민이라면 나의 선택이 사회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대선 정치의 계절이 시작됐다. 정치 뉴스라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채널을 돌리거나 건너뛰는 일만이라도 삼가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다산 칼럼] 금융불안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려면](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07.26207982.3.jpg)
![[다산 칼럼] 美·中 갈등, 한국엔 핵심역량 확보의 문제](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07.14558755.3.jpg)
![[다산 칼럼] 2030세대의 분노 그리고 의무](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07.18208630.3.jpg)


!["뜨겁다고 하지 않겠다"…CPI 앞두고 사상 최고가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20107473384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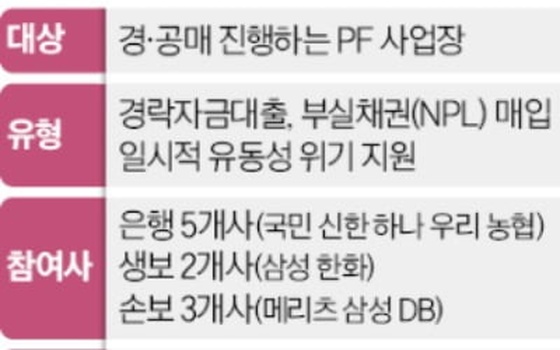
![[단독] '전기차 끝판왕' GV90 내년 12월 출격](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22134.1.jpg)


![[단독] "1억이 7억 된다" 달콤한 유혹…교수도 넋놓고 당했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00558.3.jpg)


![[이 아침의 안무가] 발레에 소소한 일상 담은 안무가, 케네스 맥밀런](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2311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