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실험, 해외선 잇단 실패…핀란드서도 도입 1년 만에 폐기
1516년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에 등장한다는 해석도 있지만 여기에는 논란이 있다. “살길이 없는 이들에게 최소 소득을 줄 필요가 있다”는 문장으로 소득 부여의 대상을 ‘살길이 없는 이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계층에 대한 소득 보조라는 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와 더 비슷하고, 전체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기본소득과는 거리가 있다.
20세기 이후에는 좌파와 우파가 모두 정책 아젠다로 제시해왔다. 우파에서는 통화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큰 정부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복지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파에서는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일자리가 감소한 탓에 생겨나는 실업자와 줄어들 가계소득을 기본소득 도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0년 이후에도 여러 나라에서 시도했지만 성공한 사례는 없다. 2016년 스위스에서는 성인에게 매달 약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주자는 제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하지만 스위스 국민들은 “높은 물가 등을 감안할 때 기본소득보다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이유 등으로 여기에 반대했다.
2017년 핀란드에서는 실업자에게 월 73만원을 주는 기본소득을 도입했다. 하지만 가중되는 예산 압박을 견디지 못한 핀란드 정부는 1년 만에 해당 정책을 폐기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엔비디아 이을 "숨은 AI 수혜주"…월가 47% 더 오를 것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2507272374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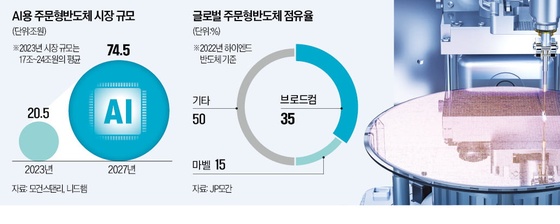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