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국민 검사'
법조 산책

국민이 검찰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때도 있었다. 2003년 검찰이 대선 자금을 수사할 때였다. 여야 모두 검찰의 날 선 칼 앞에 섰고 현역 국회의원 23명 등 정치인 40여 명이 형사처벌됐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안희정 씨도 구속됐다. 국민은 수사를 이끌었던 안대희 전 대법관(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안짱’이라 부르며 성원했다. ‘국민 검사’라는 호칭은 그가 마지막이었다.
당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노 전 대통령의 덕이 컸다. 노 전 대통령은 “여야 대선 자금 의혹을 모두 밝히자”고 제안했다. 검찰에 대한 정치적 중립 선언이었다. 검찰은 마음껏 수사에 임할 수 있었다.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 직무인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 방안에서는 ‘정치적 중립’이 잘 보이지 않는다. 관련 대선 공약 제목은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습니다’이다. 공약을 보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만 신설하면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작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하는 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정윤회 문건 파동 등에 대한 재조사를 주문한 것은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있다.
국민 검사가 사라진 것을 제도와 집권자 탓만 할 순 없다. 일부 검사가 ‘정치 검사’를 자처한 것도 요인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인기는 외압에 맞섰기 때문이다. 검찰의 직무에 충실했던 결과다.
김주완 법조팀 기자 kjwa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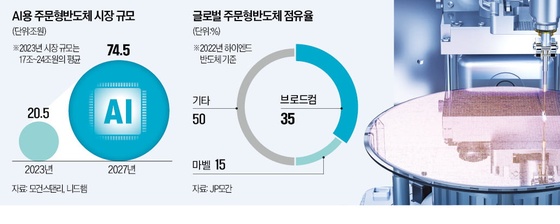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오늘의 arte] 예술인 QUIZ : '드라마 1882' 선보인 이슬람 작가](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AA.3682076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