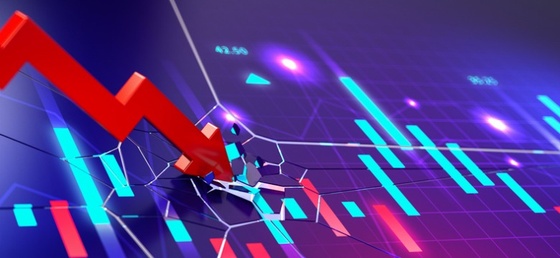작년 미국 노동생산성 부진...옐런의 우려 현실화 조짐
"낮은 생산성, 경제성장 걸림돌"
올 금리인상 발목 잡을 수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2일(현지시간) 지난해 4분기 비농업 부문 노동생산성(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생산량)이 1.3%(연율 기준)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지난 3분기 3.5%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전년 동기 대비 생산성 증가율은 1%, 노동비용 상승률은 1.9%였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실업률이 떨어지는 데 비해 경제성장률은 높지 않은 것이 낮은 생산성 증가율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생산성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들이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1.6% 늘었다. 일자리가 매달 평균 18만개 증가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지 않았다.
미국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둔화됐다. 1947년부터 지난해까지 7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1%지만, 마지막 10년(2007~2016년)만 떼놓고 보면 연평균 1.1%에 그친다. 2011년부터는 0%대에 머물고 있다. 2015년(0.9%)과 비교해도 지난해 성장률은 특히 낮은 편이다.
반면 임금 상승세는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해 비농업 부문에서 일정한 생산량을 내기 위해 들어가는 인건비를 뜻하는 단위노동비용은 2.6% 상승했다. 2015년(2.0%)보다 더 높아졌다.
이는 통화·경제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지난달 17일 샌프란시스코 커먼웰스클럽 강연에서 “생산성 증가율이 장기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 균형을 맞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0.5% 상승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연 2%씩 노동생산성이 높아졌던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