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대중공업 분사…성공은 독자경영 속도에 달렸다
현대중공업은 ‘조선 빅3’ 가운데 경영 상황이 그래도 나은 편이다. 최근 실적 발표에서도 지난 3분기에 3218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세 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나 조선해양부문 수주는 목표 대비 1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막연한 기대보다는 회사 각 부문이 각자의 생존을 위해 뛸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것이다. 분사를 통해 당장 조선부문의 재무구조도 개선하고 기타 부문의 독립경영도 꾀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부문은 부채비율이 168.5%(3분기 연결기준)에서 분사가 완료되면 100%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 분사되는 부문들도 그동안 조선부문에 가려 자원배분에 제약이 많았던 경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각 사업부문이 내년 4월로 예정된 분사 일정에 앞서 국내외 영업에 박차를 가해 독자경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사관계가 안정돼야 한다. 현대중 노조는 2013년까지 19년 무분규 기록을 세웠지만 최근 3년 연속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최후의 승부수이자 역전의 기회인 이번 구조조정을 성공시키는 것은 철저히 현대중공업 내부에 달린 일이다. 회사를 쪼개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만큼 조선산업 구조조정 성공사례를 반드시 만들어내길 기대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기고] 발명과 행복](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871799.3.jpg)
![[한경에세이] 신은 디테일에 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36586123.3.jpg)
![[윤성민 칼럼] 쿠오바디스, 삼성](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14213006.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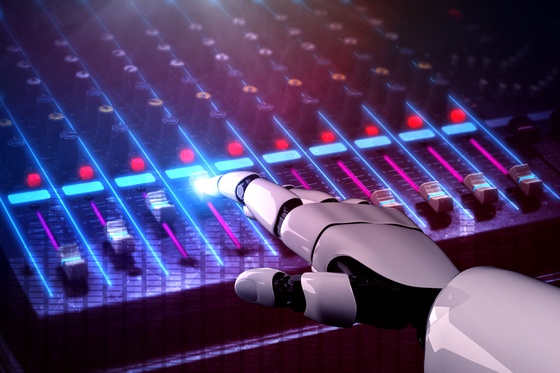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