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한국인이 세계를 보는 안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 격랑
'세계의 장사꾼' 된 한국엔 심각한 도전
국제정세 제대로 읽고 대응하는 능력 갖춰야
이제민 < 연세대 명예교수· 경제학 leejm@yonsei.ac.kr >
'세계의 장사꾼' 된 한국엔 심각한 도전
국제정세 제대로 읽고 대응하는 능력 갖춰야
이제민 < 연세대 명예교수· 경제학 leejm@yonsei.ac.kr >
![[다산칼럼] 한국인이 세계를 보는 안목](https://img.hankyung.com/photo/201607/AA.12002393.1.jpg)
따지고 보면 중국의 ‘등장’은 잘못된 표현이다. 과거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런 위치를 되찾으려 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된 데는 어느 시점엔가 중국이 유럽에 뒤처졌다는 역사적 사정이 있다. 그것은 대체로 16세기 유럽의 대항해시대부터다. 유럽보다 먼저 명나라 초기에 정화(鄭和)의 대항해가 있었지만, 그 후 폐쇄체제로 돌아선 중국은 유럽에 뒤처졌다. 19세기에는 온갖 굴욕을 겪은 뒤 반(半)식민지로 떨어졌다가 20세기 들어 일본의 침략을 받았다. 그 결과 공산혁명이 일어나 나라가 재난에 휩싸였지만, 1970년대 말 이후 자본주의로 전환함으로써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다.
중국의 고도성장은 기존 세계자본주의체제를 받아들이고 후발국으로서 그에 참여함으로써 이뤄졌다. 이제 힘이 붙으니 그 체제를 바꾸고 싶은 것이다. 여기에는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 바탕에는 기존의 헤게모니국인 미국과의 충돌이 놓여 있다.
이런 구도에서 한국의 사정은 어떤가. 이것 역시 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중국이 지배하는 동아시아에서 ‘문명국’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나름대로 정세를 보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초에 나온 ‘강리도(疆理圖)’는 정화의 대항해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지도로 당시 조선이 세계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중국과의 조공관계 아래서 폐쇄체제로 돌아선 조선왕조는 세계 속에서 자기 위치를 보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19세기 미국이 조선에 개항 요구를 했을 때 “그 문제는 중국에 물어보라”고 답한 것은 미국인들 사이에 한국인의 세계관으로 각인됐다. 개항기에는 세계를 보는 능력이 어느 정도 생겼지만, 일제강점기에 다시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광복 후 미국 헤게모니 아래 형성된 세계 정치·경제질서는 한국에 유리하게 전개됐다. 그것은 탈식민지화, 자유무역, 민주화를 내용으로 했다. 그런 구도에서 한국은 독립국이 되고 산업화와 민주화도 이룰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성공의 열쇠는 단연 산업화다.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인의 모습도 바뀌었다. 처음 한국은 ‘냉전의 선봉장’이었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세계의 장사꾼’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장사꾼은 정세를 잘못 읽으면 망한다.
중국의 등장에 따른 동아시아 격랑은 한국이 세계 정세를 읽는 능력을 테스트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에서 양자택일하라면 한국은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이 ‘단군 이래 가장 좋은 시절’을 누리게 된 것은 미국 헤게모니 아래 형성된 질서 덕분이다. 반면 중국은 민주화돼 있지 않은 개도국일 뿐 아니라, 이웃 나라를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는 DNA를 가진 나라다. 거기에다 2세기 가까이 굴욕을 당하면서 형성된 중국인의 정신세계도 있다.
이런 장기적 문제와 중·단기적 문제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다. 한국에 무엇보다 중요한 북핵 문제 해결에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 한국은 그런 공통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경제적 국익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평화를 달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면 현 정부가 처음 중국에 너무 접근해 미국을 소원하게 하고, 이제 다시 사드를 배치해 중국을 노하게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문제가 정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중·단기적 대처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장기적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는지 자문(自問)해 볼 일이다. 전반적으로 한국인이 세계를 보는 안목은 그 역사가 일천하고 그만큼 불안정하다. 한국은 그런 문제를 빨리 극복해야 계속 ‘세계의 장사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제민 < 연세대 명예교수· 경제학 leejm@yonsei.ac.k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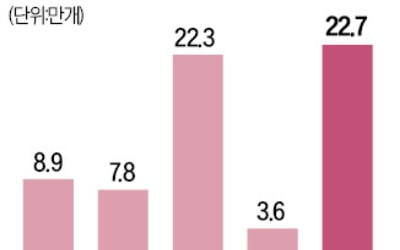
![[속보] 루마니아 헌재, '극우 승리' 대선 1차투표 무효화](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2.2257924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