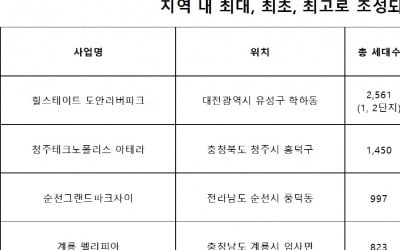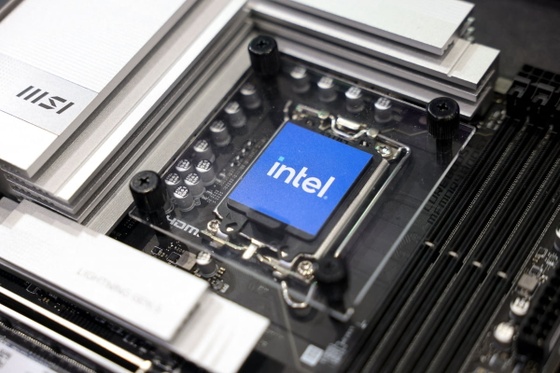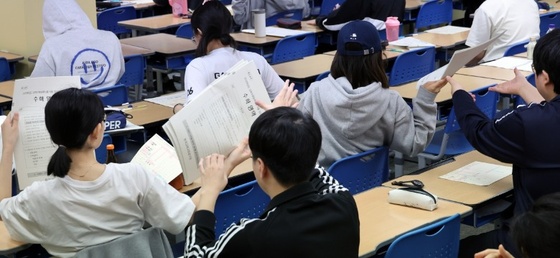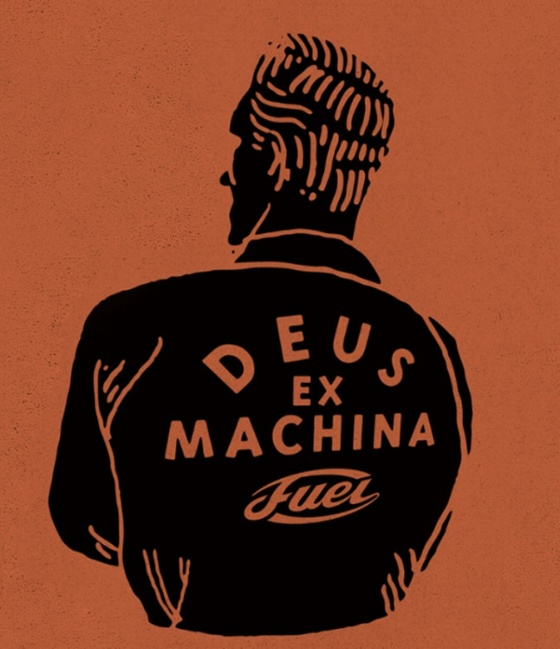[사진작가인터뷰②이정록] “‘찰’에서 칵’ 소리 들으려면 7시간은 기다려야죠”
조리개 열어두고 밤새 조명 터트려 작업
“사진작품은 작가의 독특한 시선을 이해하는 게 중요”
![[사진작가인터뷰②이정록] “‘찰’에서 칵’ 소리 들으려면 7시간은 기다려야죠”](https://img.hankyung.com/photo/201408/01.9033097.1.jpg)
![[사진작가인터뷰②이정록] “‘찰’에서 칵’ 소리 들으려면 7시간은 기다려야죠”](https://img.hankyung.com/photo/201408/01.9033130.3.jpg)
필름카메라는 찍힐 때 ‘찰칵’하고 소리를 내는데 ‘찰’하고 조리개가 열려 빛이 들어오고 ‘칵’하며 조리개가 닫힌다. ‘찰칵’의 순간 담긴 프레임 속 풍경이 사진에 남게 되는 것이다.
이 작가는 사진 속에 빛을 넣기 위해 풍경을 프레임에 담고 ‘찰’하는 순간 조리개가 열리면 검은 천으로 카메라 렌즈를 덮는다. 더 이상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다. 그리고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밤이 되면 검은 천을 걷어내고 조명기구를 터트려 빛을 사진에 주입한다. 연거푸 터지는 플래시의 빛은 사진 속에서 묘한 느낌을 주며 남는다.
이정록 작가는 “작업을 하다보면 빛의 양이 부족해 재촬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서도 “포토샵과 같은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가상의 빛을 넣을 수도 있지만 인공의 빛과 직접 터트린 빛의 차이를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그래픽 작업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진 속 오브제(작품소재)로 나무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상을 둘러싼 여러 차원의 세계를 연결하기 위한 매개체가 나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무의 뿌리는 땅으로 이어지고 줄기는 하늘을 향합니다. 사진 속 나무에서 터지는 빛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하는 의미의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나무가 실존하는 세상과 종교적 관점에서 존재하는 사후 세상을 연결하는 유일한 매개체라는 것이다. 이 작가는 “나무를 오브제로 삼아 작업한지 20년 가까이 되면서 요즘엔 길을 걷다가 때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나무와 대화를 시도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 작가는 기운이 좋은 나무를 고르는 것이 사진 작업의 시작이라고 했다. 요리사가 요리에 앞서 싱싱한 재료를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기운이 좋은 나무를 담은 사진에는 싱그러운 생명력이 묻어나온다는 게 이 작가의 말이다.
실제 제주도 한라산 중턱의 사련이 숲에서 작업한 사진작품들은 먼 옛날 볼 수 있었던 원시림의 느낌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 작가는 “사련이 숲의 좋은 에너지를 담기 위해 일주일 넘게 숲속에서 살면서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진의 매력을 리얼리티로 꼽았다. 이 작가는 “같은 풍경을 보고 그린 그림은 화가가 판타지적인 요소를 임의대로 넣을 수 있지만 사진은 그림과 달리 실존의 리얼리티를 가진다”면서 “실존하는 풍경의 증거가 사진”이라고 설명했다.
이 작가는 사진 작품을 보는데 있어 작가의 독특한 시선을 이해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요즘은 사진 기술이 워낙 발전해 테크닉적인 요소가 가미된 사진들이 많다”면서도 “테크닉적인 요소를 보기 보다는 작가의 독특한 시선과 관점을 이해라기 위해 노력해야 작품 속에 담긴 많은 함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