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래시장이 죽어가는 진짜 이유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경쟁력은 되레 퇴보하고 있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진단이다. 지난 10년간 재래시장 지원에 국민 세금 1조5711억원이 투입됐다.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 감면에다 대형 유통점의 영업제한 등 규제책까지 총동원하는 판이다. 그럼에도 재래시장은 2003년 1695개에서 2010년 1517개로 178개가 사라졌다. 전체 매출은 같은 기간 36조원에서 24조원으로 33.3%나 줄었다.
재래시장을 살리는 효과도 없이 혈세만 쓴 꼴이다. 이유는 자명하다. 처방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의 작년 설문조사를 보면 소비자들의 재래시장 기피는 ‘상품이 다양하지 않아서(34.8%)’, ‘품질이 떨어져서(13.6%)’, ‘가격이 비싸서(7.6%)’, ‘신용카드를 안 받아서(6.1%)’ 같은 기본적인 문제가 70%를 웃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은 당장 가시적 성과를 내는 시설 개·보수에 급급했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재래시장 지원금 중 시설 현대화에 86%(1조3513억원)를 쏟아부었고, 그나마 무상지원 일변도여서 상인들의 자구노력도 미흡했다. 전시행정의 표본인 셈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재래시장의 위기가 유통 대기업들의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확장에서 비롯됐다며 이들을 겨냥한 각종 규제책을 양산하고 있다. 하지만 재래시장의 진짜 적은 지난 20년간 극명하게 달라진 소비자의 선호다. 대학생 웹진인 바이트가 서울지역 대학생 200명에게 물어보니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찬반이 엇갈렸지만 재래시장을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정도다. “재래시장을 살려라. 그러나 나는 안 가겠다”는 심리다.
대형마트를 강제 휴점한 당일도 재래시장은 한산했다는 것이 현장 보고다. 재래시장 대신 대형마트나 SSM에 가고, 동네슈퍼 대신 편의점을 찾고, 동네빵집 대신 프랜차이즈 빵집을 찾는 게 요즘 소비자들이다. 가격 정찰제, 균일한 품질, 친절한 서비스, 편리한 신용카드 사용 및 환불, 엄격한 재고관리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래시장이 살 길은 이런 소비자에 맞춰 상인들 스스로 변신하고 혁신하는 것 외에는 달리 없다. 억지로 재래시장을 살리는 대책이 아니라 신속한 구조조정 대책이 오히려 필요하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기고] 발명과 행복](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36872631.3.jpg)
![[한경에세이] 신은 디테일에 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36586123.3.jpg)
![[윤성민 칼럼] 쿠오바디스, 삼성](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14213006.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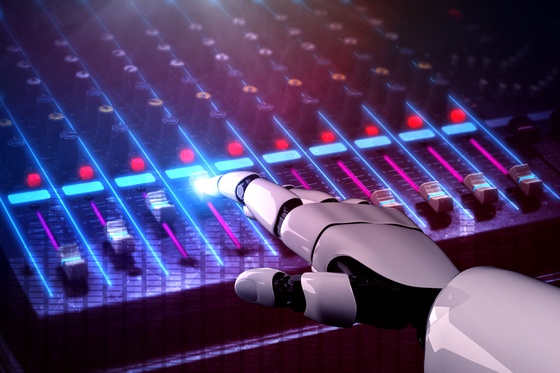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